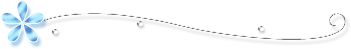<맨 아래
' 표시하기'
를 클릭하시기 바랍니
다.>


[전시회 안내] "활자의 나라, 조선" (2)
* 기간 : 2016.6.21(화) ~ 9.11(일)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고려3실
* 관람 안내 : 무료 관람 (매주 월요일 휴관)
* 도슨트 전시 설명 : 매일 11시, 14시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고려3실에서는
2016.6.21(화)부터 9.11(일)까지 3개월 동안
"활자의 나라, 조선"이라는 주제로
2016 테마전이 열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안내한 '갑인자', '실록자'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정조의 '정리자', '한구자'와 '교서관인서체자' 및 '전사자'
'한글활자'와 '목활자', 그리고 '활자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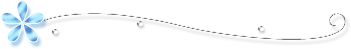
[


정리자(整理字)
정조, 치밀하게 계획하여 활자를 개량하다.
1796년(정조 20)에 완성된 정리자는 정조가 계획한
활자 개량의 결과물이자, 정조를 상징하는 활자입니다.
이 활자로 제일 먼저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사도세자의 묘소인 화성 현륭원顯隆園에 어머니를 모시고 행차한 기록)
를 간행하였습니다.
[강희자전康熙字典]의 글자체를 모방했으며, 정조는 정리자
제작에 참고하기 위해 중국에서 목활자를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1857년(철종8) 주자소 화재로 정리자가 불에 타자 다음 해
다시 만들어 현재 두 시기의 활자가 모두 남아있습니다.
정리자로는 의궤, 정조의 명으로 편찬한 책 등을
간행하였으며, 관보 등 근대 인쇄물도 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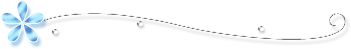
* 화성성역의궤 한면을 한면을 재현한 식자판, 26.2x37.5cm
- 식자된 판을 종이에 찍은 뒤 이부분을 반으로 접으면 책의 앞면과 뒷면이 된다.


* 정리자본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1796년, 33.8x21.8cm, 보물 제1901-1호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리자로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券首의 한면을 재현했다.

가장 많은 활자를 만든 정조
정조는 세손 시절에 이미 임진자 15만자의 주조를 주관했으며
즉위한 다음 해에 정유자 15만자를 만들었고, 이어 1782년(정조6)에는
숙종 때 만든 한구자의 글자체로 다시 한구자 8만여 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생생자 32만자를 만들고, 이 생생자의 글자체로
다시 금속활자인 정리자 30여만 자를 만들었습니다.
정조가 만든 활자는 한 국왕의 재위 기간에 만든 것으로서는
조선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수량입니다.
* 정조는 왜 정리자를 만들었을까?
정리자라는 이름은 이 활자로 찍은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의궤는 1795년(정조19,을묘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탄생 60주년이 되는 해에 생부인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는
화성 현륭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행차한 기록을 담은 것으로, 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의궤입니다. 1794년 12월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정리소'를 설치했고, 행사의 기록을 '원행을묘정리의궤'라고 이름하고,
이를 찍은 활자를 '정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을묘년의 화성 행차는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정조의
정치력과 정치 구상을 펼쳐 보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정리자 역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조의 치밀한
계획 하에 만들어진 활자이며 또한 정조의 통치 철학이나 지침을
책으로 간행하여 초야의 선비들에게까지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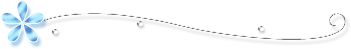







* 을해자 병용 한글 금속활자
- 을해자 병용 한글 금속활자는 17세기 활자들과 글자체뿐 아니라 활자 모양도 다르다.

한글 활자
왕세자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한글 활자를 만들다.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여서 조선시대의 활자도 대부분 한자
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왕세자 교육이나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유교 서적 언해본 간행 등을 위해서는 한글 활자도 필요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한글 금속활자 750여 자와 한글 목활자
1만 3천여 자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금속활자 30여 자는 15세기에
만든 활자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금속활자는 왕권의 상징이며 국가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글 금속활자 제작은 조선시대
통치자들에게 한글이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숙종 때 무신자로 간행한 경서언해, 영조 때 간행한 유교 서적의
언해본, 정조 때에 간행한 한글 윤음에서도 한글 금속활자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데, 이 한글 금속활자들이 18세기에 왕실에서 간행된
언해본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조 때 백성들에게 내리는 윤음(왕이 내리는 명령)에는
언해본이 붙어 있었는데, 금속활자 외에 목활자를 사용핬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에게 유교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1797년 '오륜행실도'를
간행하였는데 책의 원문은 정리자로 찍었으며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사를 판화로 찍고, 한글로 언해를 달았는데
이 언해를 찍기 위해 만든 목활자를 '오륜행실한글자'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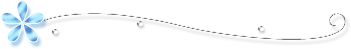

* 을해자 병용 한글 금속활자본[능엄경언해], 1461년, 37.5x24.7cm
* 불교경전'능엄경'을 한글로 풀이한 책
- 한자로 된 본문은 강희안의 글씨체로 만든 을해자로 찍었다.

* 무신자 병용 한글 금속활자본[시경언해詩經諺解], 17세기, 35.6x23.3cm
* '시경'을 한글로 풀이한 책. 한자로 된 본문은 네번째 갑인자인 무신자로 인쇄했다.
- 세자궁을 뜻하는 춘궁 도장이 찍혀 있어 왕세자 교육을 위해 간행한 책으로 보인다.

* 한글 목활자본[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1783년, 29.9x20.2cm
* 원춘도(강원도)에 흉년이 들자 그 지역 백성의 세금을 감해준다는 정조의 윤음.
- 임진자로 간행된 본문 뒤에 목활자로 한글 번역문을 인쇄해 붙였다.


* 오륜행실한글자본[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1797년, 31.7x18.9cm
- 중국과 우리나라의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기록한 책.
- 본문은 정리자로 간행, 백성들이 잘 이해하도록 고사를 판화로 찍고 한글로 언해했다.



* 한구자 韓構字

* 한구자 韓構字
* 교서관인서체자 校書館印書體字
* 전사자 全史字
- 금속활자, 사용층이 늘어나다.
조선시대에 금속활자는 국가의 전유물이었지만, 17세기 이후,
족보와 문집 제작 등 민간에서도 금속활자를 만들고 사용하였습니다.
대동법 시행으로 잘 알려진 김육의 손자인 김석주(1634-1684)는
숙종 시대의 명필인 한구의 글씨체로 한구자를 만들었고, 17-18세기에는
명나라 판본에 사용된 인서체(붓으로 쓴 듯한 글자체와 구분되는 각진 글자체)를
본떠 조선의 공식 출판기구인 교서관에서 만든 활자로 문인들이 개인의 문집을
만드는 일이 유행하였습니다. 이 활자들은 개항 후 근대식 교육을 위해 학부에서
만든 목활자와 함께 학부에서 편찬한 각종 교과서 간행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816년(순조16)에는 왕실의 외척 박종경이 청나라 판본의 글자체를 본떠
전사자를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는 민간에서 상업적 출판을 목적으로
철활자를 만들었고 이 활자로 조선왕실의 족보를 찍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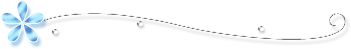

* 한구자본[규화명선奎華名選], 1792년, 28.6x18.2cm
- 정조가 선발하여 규장각에서 교육한 문신들이 지은 문장 가운데 뛰어난 것을 골라 편찬한 책

* 교서관인서체자본[우암선생문집], 1717년,
* 오른쪽은 학부목활자본[만국지지], 1895년.






* 정리자장,1857년,58.2x120.6x102.0cm
- 재주정리자를 주조할 때 만든 장이다. 안쪽 측널에 제작자의 이름이 쓰여 있다.

활자장 活字欌
활자 보관의 수수께끼를 풀다.
조선시대 금속활자는 왕권을 대표하는 것이었으므로
보관과 관리에 철저하고자 하였습니다.
활자는 7개의 장에 나누어 보관했으며,
자보를 만들어 각 장에 들어간 활자 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보의 한자 분류 방식은 한자 자전과 달리,
보관과 사용에 편리하도록 부수를 통폐합하여 축소하거나,
획수보다는 생김새에 따라 활자를 분류했습니다.
특히 활자를 관리하고 다루는 사람을 두어 활자를
저장하고 교정과 인쇄 감독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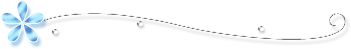

* 위부인자(갑인자)장

* 실록자장

* 정리자장의 정간판

<참고문헌>
이재정,"활자의 나라, 조선",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자료(프린트물),2016.6.20.
이재정, 2016테마전 "활자의 나라,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비매품, 2016.6.21.
이 자료는 이재정 연구관님이 제공한 위의 참고자료와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연수자료를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며, 이 전시회 해설에 도움을 줄 의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료 제공 및 연수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6일
이경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