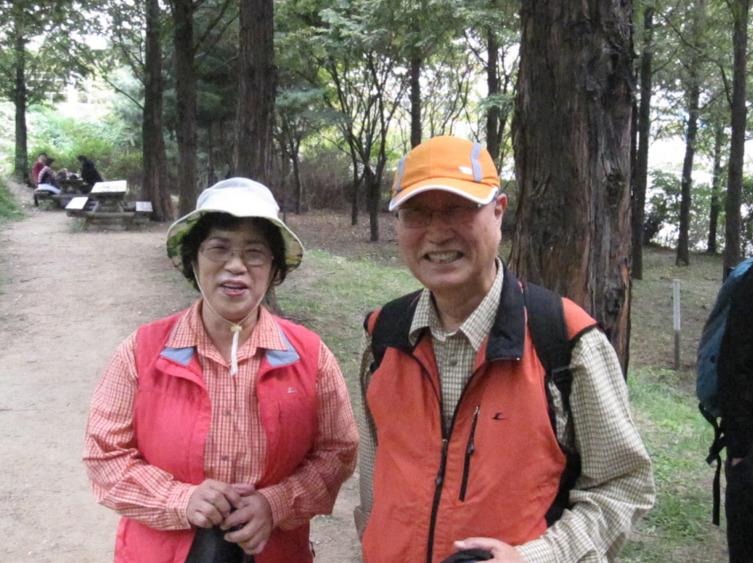새로운 사상, 성리학의 도입
몽골의 침략과 원 간섭기를 겪으면서 고려 농민들의 항쟁抗爭과 유망流亡은 지배 질서를
위태롭게 하였고, 고려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었던 불교는 여러 모순과 폐단 속에
빠지게 되었다. 고려 사회는 이런 혼란한 현실을 타개하고 희만적인 사회를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하였고, 원을 왕래하던 안향安珦과 그의 제자 백이정白頤正등에 의해
성리학이 도입되었다.
공민왕의 개혁으로 성균관이 중흥되고 성리학풍이 일어나면서, 점차 과거시험에도 성리학을 중시하였다.
권부權溥가 주자의 [사서집주四書集註]를 간행하며 성리학의 보급에 힘쓴 이후, 이제현李齋賢.이색李穡.
길재吉再 등의 유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연구하였고, 이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다.
 성균관의 중흥에 기여한 이색의 초상화(牧隱 李穡 肖像畵)
고려 말의 대학자 이색의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는 조선시대에 다시 그려진 이모본移摹本이지만
왼쪽을 바라보는 얼굴 방향이나 이목구비를 선 위주로 표현한 고식古式은 고려 말 초상화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선 초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색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따라
성균관을 다시 짓고 성리학풍을 일으키며 신진사대부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문하에 정몽주. 길재. 이숭인. 정도전. 하륜. 윤소종. 권근 등 많은 제자들을 배출시켰다.
성균관의 중흥에 기여한 이색의 초상화(牧隱 李穡 肖像畵)
고려 말의 대학자 이색의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는 조선시대에 다시 그려진 이모본移摹本이지만
왼쪽을 바라보는 얼굴 방향이나 이목구비를 선 위주로 표현한 고식古式은 고려 말 초상화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선 초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색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따라
성균관을 다시 짓고 성리학풍을 일으키며 신진사대부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문하에 정몽주. 길재. 이숭인. 정도전. 하륜. 윤소종. 권근 등 많은 제자들을 배출시켰다.
 정몽주의 초상화(鄭夢周 肖像)
이한철李漢喆(1808~?), 1880년(조선 고종 17), 1917년 구입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의 초상화이다. 조선 고종 때 궁중 화가이던 이한철이
개성 숭양서원崧陽書院에 있던 초상화를 옮겨 그린 것이다. 이 초상은 얼굴의 방향이나
사모 및 관복의 형태에서 고려 말의 형식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둥근 눈 주변의 주름살과
관복의 주름살 사이에 가해진 약간의 음영 표현은 19세기 조선 고종 때 제작 당시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정몽주의 초상화(鄭夢周 肖像)
이한철李漢喆(1808~?), 1880년(조선 고종 17), 1917년 구입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의 초상화이다. 조선 고종 때 궁중 화가이던 이한철이
개성 숭양서원崧陽書院에 있던 초상화를 옮겨 그린 것이다. 이 초상은 얼굴의 방향이나
사모 및 관복의 형태에서 고려 말의 형식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둥근 눈 주변의 주름살과
관복의 주름살 사이에 가해진 약간의 음영 표현은 19세기 조선 고종 때 제작 당시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정몽주의 문집(圃隱先生集), 1769년(영조45), 2004년 구입
정몽주의 문집(圃隱先生集), 1769년(영조45), 2004년 구입
 정도전의 시문집(三峰先生集), 조선, 2005년 구입
역사의 갈림길에 선 정몽주와 정도전(鄭夢周와 鄭道傳)
정몽주와 정도전, 두 사람은 고려 말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이색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하며
마음을 같이 한 친구로 고려의 개혁을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역성혁명의 갈림길에서
정몽주는 정도전과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1392년 3월 죽음을 맞았고 지금까지도 충절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다.
한편 정도전은 이성계를 추대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다.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당시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꿈꾸었고,
자신의 이상과 꿈을 이성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정도전의 시문집(三峰先生集), 조선, 2005년 구입
역사의 갈림길에 선 정몽주와 정도전(鄭夢周와 鄭道傳)
정몽주와 정도전, 두 사람은 고려 말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이색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하며
마음을 같이 한 친구로 고려의 개혁을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역성혁명의 갈림길에서
정몽주는 정도전과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1392년 3월 죽음을 맞았고 지금까지도 충절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다.
한편 정도전은 이성계를 추대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다.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당시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꿈꾸었고,
자신의 이상과 꿈을 이성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홍무이십사년명백자발명문(洪武二十四年銘白磁鉢銘文)
이성계와 그의 지지자들이 만든 사리구(李成桂 發願 舍利具), 공양왕 2~3년(1390~1391)
높이 19.8 cm(은제도금사리탑)
명문
自釋迦如來 入滅徑二千余
年大明洪武 隱月菴与
松軒時中 余萬人
同發誓願 諆藏金剛山
直待彌勒世 不願三會時
重開瞻禮佛 此願堅固
大明洪武 二十四年辛未
四月日立願 同願砂合 造幽谷
홍무이십사년명백자발명문(洪武二十四年銘白磁鉢銘文)
이성계와 그의 지지자들이 만든 사리구(李成桂 發願 舍利具), 공양왕 2~3년(1390~1391)
높이 19.8 cm(은제도금사리탑)
명문
自釋迦如來 入滅徑二千余
年大明洪武 隱月菴与
松軒時中 余萬人
同發誓願 諆藏金剛山
直待彌勒世 不願三會時
重開瞻禮佛 此願堅固
大明洪武 二十四年辛未
四月日立願 同願砂合 造幽谷



 은제 도금 팔각당형 사리기에 새겨진 글
庚午三月日造成舍利 - 경오년 삼월일 사리함을 조성하여
塔奉持納子月菴 - 경건한 마음으로 보전(봉안)합니다. 수행자 월암
施主 加伊氏 安月 同知密直 -시주는 가이씨 안월 동지밀직
黃希采又 朴氏福壽 樂浪郡夫人 -황희석 박씨복수 낙랑군부인
妙禪康澤 江陽郡夫人 -묘선 강택 강양군부인
李氏妙情 勝田宝德 樂安郡夫人 -이씨묘정 승전보덕 낙안군부인
金氏孝人 希寬 口志 信南 -김씨 효인희관 口지 신남
造羅得富 李氏奴龍 朴子靑 -만든이는 나득부 이씨노룡 박자청
領三司事 洪永通 貞順宅主 黃氏 興海郡夫人 裵氏采又碑
영삼사사 홍영통, 정순택주 황씨, 흥해군부인, 배씨석비
은제 도금 팔각당형 사리기에 새겨진 글
庚午三月日造成舍利 - 경오년 삼월일 사리함을 조성하여
塔奉持納子月菴 - 경건한 마음으로 보전(봉안)합니다. 수행자 월암
施主 加伊氏 安月 同知密直 -시주는 가이씨 안월 동지밀직
黃希采又 朴氏福壽 樂浪郡夫人 -황희석 박씨복수 낙랑군부인
妙禪康澤 江陽郡夫人 -묘선 강택 강양군부인
李氏妙情 勝田宝德 樂安郡夫人 -이씨묘정 승전보덕 낙안군부인
金氏孝人 希寬 口志 信南 -김씨 효인희관 口지 신남
造羅得富 李氏奴龍 朴子靑 -만든이는 나득부 이씨노룡 박자청
領三司事 洪永通 貞順宅主 黃氏 興海郡夫人 裵氏采又碑
영삼사사 홍영통, 정순택주 황씨, 흥해군부인, 배씨석비
 원통형 은판의 표면에는
‘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守門下侍中 李成桂 三韓國大夫人 康氏 勿其氏’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불사의 핵심 발원자인 이성계와 그 부인 강씨를 기록한 것이다.
원통형 은판의 표면에는
‘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守門下侍中 李成桂 三韓國大夫人 康氏 勿其氏’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불사의 핵심 발원자인 이성계와 그 부인 강씨를 기록한 것이다.

 관세음보살(木製 觀世音菩薩 坐像)
관세음보살(木製 觀世音菩薩 坐像)


 청동 毘盧遮那佛 坐像과 청동 祖師 좌상
청동 毘盧遮那佛 坐像과 청동 祖師 좌상



 경기도 여주에서 발견된 "청녕4년淸寧四年"이 새겨진 종이다., 보물 1166호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상품리 발견, 1058년(고려 문종 12), 1969년 입수
청녕은 거란 道宗의 연호이고 청녕4년은 1058년(文宗 12)으로 이 종의 제작 연도를 말해준다.
통일신라 동종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 동종은 11세기경부터 고려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이 동종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용이 정면을 바라보거나 위패형 명문들이 등장하고,
상단의 위를 꽃잎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두른 대가 표현되기 시작하여, 종을 치는 부위인
당좌가 사방에 1개씩 4개로 늘어났다. 이 동종은 명문에서 말해주듯 당시 임금이었던
문종의 장수를 기원하는 발원에 의하여[特爲聖壽天長之願] 150근의 중량으로 제작되었다.
경기도 여주에서 발견된 "청녕4년淸寧四年"이 새겨진 종이다., 보물 1166호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상품리 발견, 1058년(고려 문종 12), 1969년 입수
청녕은 거란 道宗의 연호이고 청녕4년은 1058년(文宗 12)으로 이 종의 제작 연도를 말해준다.
통일신라 동종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 동종은 11세기경부터 고려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이 동종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용이 정면을 바라보거나 위패형 명문들이 등장하고,
상단의 위를 꽃잎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두른 대가 표현되기 시작하여, 종을 치는 부위인
당좌가 사방에 1개씩 4개로 늘어났다. 이 동종은 명문에서 말해주듯 당시 임금이었던
문종의 장수를 기원하는 발원에 의하여[特爲聖壽天長之願] 150근의 중량으로 제작되었다.


 보살(金銅 菩薩 坐像)
고려 14~15세기, 2009년 구입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보살상이다. 통통하게 살이 붙은 둥근 얼굴,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표정,
도포 형태로 걸친 천의, 높이 올려 묶은 보개 등 고려 후기 불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영락 장식이 번잡하게 늘어지고 가슴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은 14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다.
서산대사가 "보살은 오로지 중생에 대한 생각뿐이다"라고 말하였듯이 보살은 자신이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중생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보살(金銅 菩薩 坐像)
고려 14~15세기, 2009년 구입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보살상이다. 통통하게 살이 붙은 둥근 얼굴,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표정,
도포 형태로 걸친 천의, 높이 올려 묶은 보개 등 고려 후기 불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영락 장식이 번잡하게 늘어지고 가슴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은 14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다.
서산대사가 "보살은 오로지 중생에 대한 생각뿐이다"라고 말하였듯이 보살은 자신이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중생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아미타불(金銅 阿彌陀佛 坐像)
고려, 1910년 구입
아미타불(金銅 阿彌陀佛 坐像)
고려, 1910년 구입


 다층 소탑(靑銅 多層 小塔)
1(우측).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발견, 고려, 1976년 입수,
2(중앙). 고려, 1909년 구입,
3(좌측). 고려 1916년 입수
다층 소탑(靑銅 多層 小塔)
1(우측).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발견, 고려, 1976년 입수,
2(중앙). 고려, 1909년 구입,
3(좌측). 고려 1916년 입수

 1.사리감, 고려11세기, 2.사리구, 고려 14세기, 1916년 구입, 3.사리기, 고려, 2000년 구입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장엄구
부처의 사리를 넣는 용기와 주위를 장식하는 것을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라고 한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화장하여 나온 사리는 곧 부처님의 몸과 같은 존재이다. 불교도들은
사리 안쪽에 놓이는 사리기일수록 좋은 재료를 사용하였고, 금.은.도자.수정.석재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몇 겹의 사리기를 만들어 귀중하고 소중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으로 라마탑의 모습을 한 다층사리기가 제작되었고 내부 사리기는
당시 제작된 탑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 사리기 외함의 재질을 도자기로 만들고
내함은 수정이나 금속제병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1.사리감, 고려11세기, 2.사리구, 고려 14세기, 1916년 구입, 3.사리기, 고려, 2000년 구입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장엄구
부처의 사리를 넣는 용기와 주위를 장식하는 것을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라고 한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화장하여 나온 사리는 곧 부처님의 몸과 같은 존재이다. 불교도들은
사리 안쪽에 놓이는 사리기일수록 좋은 재료를 사용하였고, 금.은.도자.수정.석재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몇 겹의 사리기를 만들어 귀중하고 소중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으로 라마탑의 모습을 한 다층사리기가 제작되었고 내부 사리기는
당시 제작된 탑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 사리기 외함의 재질을 도자기로 만들고
내함은 수정이나 금속제병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석장(錫杖)
석장(錫杖)

 금강령(金剛鈴)과 금강저(金剛杵)
금강령(金剛鈴)과 금강저(金剛杵)

 비사문천과 관음보살이 함께 새겨진 거울(靑銅毘沙門天. 觀音菩薩文 鏡像)
1, 2. 모두 거울 뒷면에 새겨진 도상, 고려, 1916년 구입
비사문천과 관음보살이 함께 새겨진 거울(靑銅毘沙門天. 觀音菩薩文 鏡像)
1, 2. 모두 거울 뒷면에 새겨진 도상, 고려, 1916년 구입
 부처가 새겨진 거울(靑銅 鏡像)
3. 고려
부처가 새겨진 거울(靑銅 鏡像)
3. 고려
 개인신앙과 호신불
고려 후기에는 현실에서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소형의 호신불.경상(鏡像).불감(佛龕) 등을 만들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들 도구에는
당시에 유행한 관음보살상과 비사문천상, 마리지천상 등이 새겨지거나 조각되었다.
고려시대 유행한 비사문천은 한 손에는 보탑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든 모습으로 재물과 복.
부귀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마리지천은 6개 혹은 8개의 팔에 보탑.바늘.금강저.무우수 가지 등의
지물을 지닌 모습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통하였다. 이들은 고려인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번뇌에 빠진 마음을 다스리며, 내세의 복을 구하는 도구이기도하였다.
개인신앙과 호신불
고려 후기에는 현실에서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소형의 호신불.경상(鏡像).불감(佛龕) 등을 만들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들 도구에는
당시에 유행한 관음보살상과 비사문천상, 마리지천상 등이 새겨지거나 조각되었다.
고려시대 유행한 비사문천은 한 손에는 보탑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든 모습으로 재물과 복.
부귀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마리지천은 6개 혹은 8개의 팔에 보탑.바늘.금강저.무우수 가지 등의
지물을 지닌 모습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통하였다. 이들은 고려인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번뇌에 빠진 마음을 다스리며, 내세의 복을 구하는 도구이기도하였다.



 풍탁(靑銅 風鐸)
풍탁은 사찰의 탑이나 건물의 모서리에 달아 시각과 청각적 효과를 내는 장엄구로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종 모양의 풍탁(1)이
주로 만들어졌고, 후기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풍탁(2)이 유행하였다. 종 모양의 풍탁이
종의 요소를 가지는 반면, 사다리꼴 모양의 풍탁은 불보살상을 비롯해 범자와 심엽형
구멍 등 다양한 장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풍탁(靑銅 風鐸)
풍탁은 사찰의 탑이나 건물의 모서리에 달아 시각과 청각적 효과를 내는 장엄구로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종 모양의 풍탁(1)이
주로 만들어졌고, 후기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풍탁(2)이 유행하였다. 종 모양의 풍탁이
종의 요소를 가지는 반면, 사다리꼴 모양의 풍탁은 불보살상을 비롯해 범자와 심엽형
구멍 등 다양한 장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청동 은입사 향완(靑銅 銀入絲 香碗)
청동 은입사 향완(靑銅 銀入絲 香碗)
 (좌)뚜껑이 있는 향로(有蓋 청동 香爐),(중) 고려 11세기, 향완(청동), (우)은입사 향완
(좌)뚜껑이 있는 향로(有蓋 청동 香爐),(중) 고려 11세기, 향완(청동), (우)은입사 향완
 이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제4편으로 전부 수집하여 그 사진과 글로
모두 올렸습니다(끝).
사진과 글
권진순
2016년 1월13일
이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제4편으로 전부 수집하여 그 사진과 글로
모두 올렸습니다(끝).
사진과 글
권진순
2016년 1월13일
성균관의 중흥에 기여한 이색의 초상화(牧隱 李穡 肖像畵) 고려 말의 대학자 이색의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는 조선시대에 다시 그려진 이모본移摹本이지만 왼쪽을 바라보는 얼굴 방향이나 이목구비를 선 위주로 표현한 고식古式은 고려 말 초상화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선 초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색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따라 성균관을 다시 짓고 성리학풍을 일으키며 신진사대부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문하에 정몽주. 길재. 이숭인. 정도전. 하륜. 윤소종. 권근 등 많은 제자들을 배출시켰다.
정몽주의 초상화(鄭夢周 肖像) 이한철李漢喆(1808~?), 1880년(조선 고종 17), 1917년 구입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의 초상화이다. 조선 고종 때 궁중 화가이던 이한철이 개성 숭양서원崧陽書院에 있던 초상화를 옮겨 그린 것이다. 이 초상은 얼굴의 방향이나 사모 및 관복의 형태에서 고려 말의 형식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둥근 눈 주변의 주름살과 관복의 주름살 사이에 가해진 약간의 음영 표현은 19세기 조선 고종 때 제작 당시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정몽주의 문집(圃隱先生集), 1769년(영조45), 2004년 구입
정도전의 시문집(三峰先生集), 조선, 2005년 구입 역사의 갈림길에 선 정몽주와 정도전(鄭夢周와 鄭道傳) 정몽주와 정도전, 두 사람은 고려 말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이색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하며 마음을 같이 한 친구로 고려의 개혁을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역성혁명의 갈림길에서 정몽주는 정도전과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1392년 3월 죽음을 맞았고 지금까지도 충절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다. 한편 정도전은 이성계를 추대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다.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당시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꿈꾸었고, 자신의 이상과 꿈을 이성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홍무이십사년명백자발명문(洪武二十四年銘白磁鉢銘文) 이성계와 그의 지지자들이 만든 사리구(李成桂 發願 舍利具), 공양왕 2~3년(1390~1391) 높이 19.8 cm(은제도금사리탑) 명문 自釋迦如來 入滅徑二千余 年大明洪武 隱月菴与 松軒時中 余萬人 同發誓願 諆藏金剛山 直待彌勒世 不願三會時 重開瞻禮佛 此願堅固 大明洪武 二十四年辛未 四月日立願 同願砂合 造幽谷



은제 도금 팔각당형 사리기에 새겨진 글 庚午三月日造成舍利 - 경오년 삼월일 사리함을 조성하여 塔奉持納子月菴 - 경건한 마음으로 보전(봉안)합니다. 수행자 월암 施主 加伊氏 安月 同知密直 -시주는 가이씨 안월 동지밀직 黃希采又 朴氏福壽 樂浪郡夫人 -황희석 박씨복수 낙랑군부인 妙禪康澤 江陽郡夫人 -묘선 강택 강양군부인 李氏妙情 勝田宝德 樂安郡夫人 -이씨묘정 승전보덕 낙안군부인 金氏孝人 希寬 口志 信南 -김씨 효인희관 口지 신남 造羅得富 李氏奴龍 朴子靑 -만든이는 나득부 이씨노룡 박자청 領三司事 洪永通 貞順宅主 黃氏 興海郡夫人 裵氏采又碑 영삼사사 홍영통, 정순택주 황씨, 흥해군부인, 배씨석비
원통형 은판의 표면에는 ‘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守門下侍中 李成桂 三韓國大夫人 康氏 勿其氏’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불사의 핵심 발원자인 이성계와 그 부인 강씨를 기록한 것이다.

관세음보살(木製 觀世音菩薩 坐像)


청동 毘盧遮那佛 坐像과 청동 祖師 좌상



경기도 여주에서 발견된 "청녕4년淸寧四年"이 새겨진 종이다., 보물 1166호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상품리 발견, 1058년(고려 문종 12), 1969년 입수 청녕은 거란 道宗의 연호이고 청녕4년은 1058년(文宗 12)으로 이 종의 제작 연도를 말해준다. 통일신라 동종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 동종은 11세기경부터 고려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이 동종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용이 정면을 바라보거나 위패형 명문들이 등장하고, 상단의 위를 꽃잎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두른 대가 표현되기 시작하여, 종을 치는 부위인 당좌가 사방에 1개씩 4개로 늘어났다. 이 동종은 명문에서 말해주듯 당시 임금이었던 문종의 장수를 기원하는 발원에 의하여[特爲聖壽天長之願] 150근의 중량으로 제작되었다.


보살(金銅 菩薩 坐像) 고려 14~15세기, 2009년 구입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보살상이다. 통통하게 살이 붙은 둥근 얼굴,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표정, 도포 형태로 걸친 천의, 높이 올려 묶은 보개 등 고려 후기 불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영락 장식이 번잡하게 늘어지고 가슴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은 14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다. 서산대사가 "보살은 오로지 중생에 대한 생각뿐이다"라고 말하였듯이 보살은 자신이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중생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아미타불(金銅 阿彌陀佛 坐像) 고려, 1910년 구입


다층 소탑(靑銅 多層 小塔) 1(우측).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발견, 고려, 1976년 입수, 2(중앙). 고려, 1909년 구입, 3(좌측). 고려 1916년 입수

1.사리감, 고려11세기, 2.사리구, 고려 14세기, 1916년 구입, 3.사리기, 고려, 2000년 구입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장엄구 부처의 사리를 넣는 용기와 주위를 장식하는 것을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라고 한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화장하여 나온 사리는 곧 부처님의 몸과 같은 존재이다. 불교도들은 사리 안쪽에 놓이는 사리기일수록 좋은 재료를 사용하였고, 금.은.도자.수정.석재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몇 겹의 사리기를 만들어 귀중하고 소중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으로 라마탑의 모습을 한 다층사리기가 제작되었고 내부 사리기는 당시 제작된 탑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 사리기 외함의 재질을 도자기로 만들고 내함은 수정이나 금속제병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석장(錫杖)

금강령(金剛鈴)과 금강저(金剛杵)

비사문천과 관음보살이 함께 새겨진 거울(靑銅毘沙門天. 觀音菩薩文 鏡像) 1, 2. 모두 거울 뒷면에 새겨진 도상, 고려, 1916년 구입
부처가 새겨진 거울(靑銅 鏡像) 3. 고려
개인신앙과 호신불 고려 후기에는 현실에서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소형의 호신불.경상(鏡像).불감(佛龕) 등을 만들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들 도구에는 당시에 유행한 관음보살상과 비사문천상, 마리지천상 등이 새겨지거나 조각되었다. 고려시대 유행한 비사문천은 한 손에는 보탑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든 모습으로 재물과 복. 부귀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마리지천은 6개 혹은 8개의 팔에 보탑.바늘.금강저.무우수 가지 등의 지물을 지닌 모습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통하였다. 이들은 고려인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번뇌에 빠진 마음을 다스리며, 내세의 복을 구하는 도구이기도하였다.



풍탁(靑銅 風鐸) 풍탁은 사찰의 탑이나 건물의 모서리에 달아 시각과 청각적 효과를 내는 장엄구로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종 모양의 풍탁(1)이 주로 만들어졌고, 후기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풍탁(2)이 유행하였다. 종 모양의 풍탁이 종의 요소를 가지는 반면, 사다리꼴 모양의 풍탁은 불보살상을 비롯해 범자와 심엽형 구멍 등 다양한 장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청동 은입사 향완(靑銅 銀入絲 香碗)
(좌)뚜껑이 있는 향로(有蓋 청동 香爐),(중) 고려 11세기, 향완(청동), (우)은입사 향완
이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제4편으로 전부 수집하여 그 사진과 글로 모두 올렸습니다(끝). 사진과 글 권진순 2016년 1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