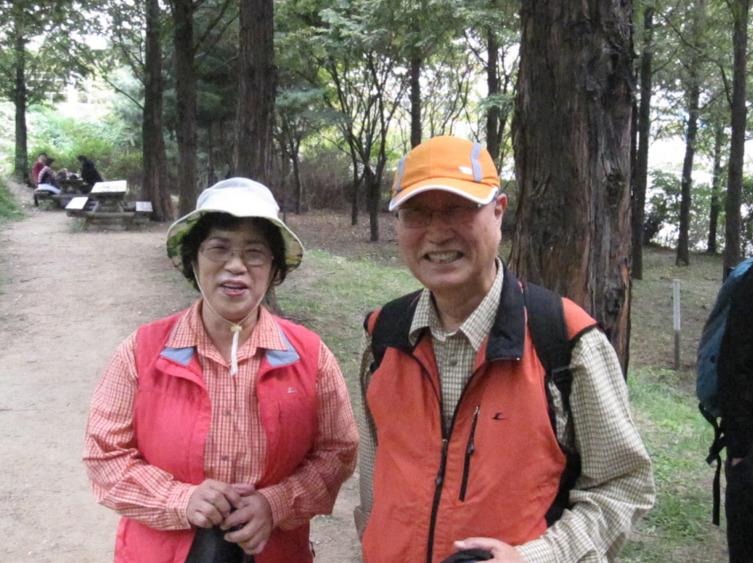경전함(나전 경함螺鈿經函)
고려 후기, 2014년 (사)국립중앙박물관회 기증
나전으로 만든 대장경을 담은 상자이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유사한 형태의 나전경함은
세계적으로 8점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 상자에는 주로 모란당초 무늬가 표현되었고,
총 2만 5천여 개의 자개가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자개를 가늘게 잘라내어 무늬를 만들었다. 골회 옻칠과 검은 옻칠을 여러번 발라
도장하여 나무의 뒤틀림과 갈라짐을 방지하였다.
경전함(나전 경함螺鈿經函)
고려 후기, 2014년 (사)국립중앙박물관회 기증
나전으로 만든 대장경을 담은 상자이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유사한 형태의 나전경함은
세계적으로 8점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 상자에는 주로 모란당초 무늬가 표현되었고,
총 2만 5천여 개의 자개가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자개를 가늘게 잘라내어 무늬를 만들었다. 골회 옻칠과 검은 옻칠을 여러번 발라
도장하여 나무의 뒤틀림과 갈라짐을 방지하였다.




 청자 도교 인물 모양 주전자(靑磁 道釋人物形 注子)
국보 제167호, 높이 28.0cm, 바닥지름 19.7cm, 대구광역시 동구 내동 출토, 1977년 입수
인물의 형상을 정교하게 본떠 만든 완전한 형태의 사람 모양 주자이다.
보관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복숭아를 담은 바구니를 받쳐 들고서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도사道士나 전설 속의 서왕모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왕모는 곤륜산 정상에 있는 궁에 기거하며 불로불사와 신선 세계를 주관한다고 한다.
고려시대 도교의 성행과 함께 도교적 색채를 띠는 상형청자가 많이 제작되었다.
청자 도교 인물 모양 주전자(靑磁 道釋人物形 注子)
국보 제167호, 높이 28.0cm, 바닥지름 19.7cm, 대구광역시 동구 내동 출토, 1977년 입수
인물의 형상을 정교하게 본떠 만든 완전한 형태의 사람 모양 주자이다.
보관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복숭아를 담은 바구니를 받쳐 들고서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도사道士나 전설 속의 서왕모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왕모는 곤륜산 정상에 있는 궁에 기거하며 불로불사와 신선 세계를 주관한다고 한다.
고려시대 도교의 성행과 함께 도교적 색채를 띠는 상형청자가 많이 제작되었다.
 대나무 무늬 주자와 승반(靑磁 陽刻 竹節文 注子.承盤)
고려 12세기
상형청자의 멋을 잘 보여주는 죽절형 주자와 승반이다.
댓가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다듬은 모양의 몸체에 대나무 모양의 주구注口와 손잡이가 달려 있다.
대나무 마디 마디의 곁면 자국을 표현하여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뚜껑은 몸체와 그대로 이어지도록 선이나 문양 구성에서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보이며,
뚜껑 꼭지와 손잡이 윗부분에 서로 끈을 꿰어 맬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다.
"고려 2실"
대나무 무늬 주자와 승반(靑磁 陽刻 竹節文 注子.承盤)
고려 12세기
상형청자의 멋을 잘 보여주는 죽절형 주자와 승반이다.
댓가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다듬은 모양의 몸체에 대나무 모양의 주구注口와 손잡이가 달려 있다.
대나무 마디 마디의 곁면 자국을 표현하여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뚜껑은 몸체와 그대로 이어지도록 선이나 문양 구성에서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보이며,
뚜껑 꼭지와 손잡이 윗부분에 서로 끈을 꿰어 맬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다.
"고려 2실"
 무신정권과 강화 천도
12세기 귀족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사회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드러내었다. 문신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의 불만은 의종의 사치스런
생활과 실정으로 폭발되어 마침내 1170년(의종 24)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정중부가 주도하던 무신정권은 경대승-이의민으로 이어졌고 1196년(명종26) 최충헌이
집권하면서 최우(뒤에 최이로 개명)-최항-최의의 4대에 이르는 최씨 정권이 성립하였다.
1231년(고종 18)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자, 이듬해 최이는 항전을 결의하며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무신정권과 강화 천도
12세기 귀족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사회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드러내었다. 문신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의 불만은 의종의 사치스런
생활과 실정으로 폭발되어 마침내 1170년(의종 24)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정중부가 주도하던 무신정권은 경대승-이의민으로 이어졌고 1196년(명종26) 최충헌이
집권하면서 최우(뒤에 최이로 개명)-최항-최의의 4대에 이르는 최씨 정권이 성립하였다.
1231년(고종 18)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자, 이듬해 최이는 항전을 결의하며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선후기
고려 후기 문인 이규보의 문집이다. 이 문집에는 그의 문학성이 돋보이는 시뿐만 아니라
당대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글들도 함께 수록되었다. 대서사시 [동명왕편] 술을 의인화한
[국선생전] 팔만대장경 판각의 연혁을 알게 해주는 [대장경각기고문] 등은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되는 글이다.
이규보는 과거에 응시하여 3번의 낙방을 거쳐 23세에 합격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중앙관료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41세 때였다. 늦게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최씨 무신정권기의 대표적 문신이었다.
금림의 버들에 의탁하길 기대하오니
원컨대 긴 가지 하나를 빌려주소서
禁林期託柳 願借一長條
[동국이상국집] 권2, 정유승선呈柳承宣
(이규보가 당시 고위 관리엿던 유승선에게 관직을 구하는 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선후기
고려 후기 문인 이규보의 문집이다. 이 문집에는 그의 문학성이 돋보이는 시뿐만 아니라
당대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글들도 함께 수록되었다. 대서사시 [동명왕편] 술을 의인화한
[국선생전] 팔만대장경 판각의 연혁을 알게 해주는 [대장경각기고문] 등은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되는 글이다.
이규보는 과거에 응시하여 3번의 낙방을 거쳐 23세에 합격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중앙관료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41세 때였다. 늦게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최씨 무신정권기의 대표적 문신이었다.
금림의 버들에 의탁하길 기대하오니
원컨대 긴 가지 하나를 빌려주소서
禁林期託柳 願借一長條
[동국이상국집] 권2, 정유승선呈柳承宣
(이규보가 당시 고위 관리엿던 유승선에게 관직을 구하는 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풀이한 글(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 別行疏)
1387년(고려 우왕 13), 2003년 송성문 기증, 보물 1126호
[화엄경] 가운데 보현보살의 행원행원을 기록한 [보현행원품]을 징관이 해설한 글이다.
1256년(고종 43)에 최우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책을 1387년(우왕 13)에 다시 새겨 찍은 것으로,
이색이 발문을 지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이 융성하였고 그 가운데 특히 보현보살의 열 가지
실천행을 담은 [보현행원품]을 별도의 책으로 간행하여 즐겨 독송하였다.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풀이한 글(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 別行疏)
1387년(고려 우왕 13), 2003년 송성문 기증, 보물 1126호
[화엄경] 가운데 보현보살의 행원행원을 기록한 [보현행원품]을 징관이 해설한 글이다.
1256년(고종 43)에 최우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책을 1387년(우왕 13)에 다시 새겨 찍은 것으로,
이색이 발문을 지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이 융성하였고 그 가운데 특히 보현보살의 열 가지
실천행을 담은 [보현행원품]을 별도의 책으로 간행하여 즐겨 독송하였다.


 1. 단지, 2. 매병, 3. 잔(靑磁象嵌菊花文盞),강화읍 남산리 발견,1980년 입수
삼별초와 대몽 항쟁
몽골군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나 고려 정부는 몽골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였으며, 결국 1258년(고종 45)에는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정변이 일어났다.
다음해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졌고, 1270년(원종11)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무신 정권의
군사적 뒷받침이 되었던 삼별초는 이에 반발하며 항몽 정권을 수립하고, 진도의 용장산성,
제주도의 항파두리성을 거점으로 대몽 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273년(원종 14) 고려와 원의
연합군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되어 40여년만에 걸친 대몽 항쟁이 막을 내렸다.
1. 단지, 2. 매병, 3. 잔(靑磁象嵌菊花文盞),강화읍 남산리 발견,1980년 입수
삼별초와 대몽 항쟁
몽골군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나 고려 정부는 몽골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였으며, 결국 1258년(고종 45)에는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정변이 일어났다.
다음해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졌고, 1270년(원종11)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무신 정권의
군사적 뒷받침이 되었던 삼별초는 이에 반발하며 항몽 정권을 수립하고, 진도의 용장산성,
제주도의 항파두리성을 거점으로 대몽 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273년(원종 14) 고려와 원의
연합군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되어 40여년만에 걸친 대몽 항쟁이 막을 내렸다.

 진도 용장산성 출토품(龍藏山城 出土品)
수막새(瓦當)
진도 용장산성 출토품(龍藏山城 出土品)
수막새(瓦當)
 진도 용장산성 출토품
"사도四道"를 새긴 기와("四道"銘 瓦), "대장혜大匠惠"를 새긴 기와("大匠惠'銘 瓦)
진도 용장산성 출토품
"사도四道"를 새긴 기와("四道"銘 瓦), "대장혜大匠惠"를 새긴 기와("大匠惠'銘 瓦)
 진도 용장산성 출토품
4. 잔(靑磁象嵌菊花文 盞), 5. 말 모양 토제품(土製馬), 6. 말 모양 철제품(鐵製馬)
진도 용장산성 출토품
4. 잔(靑磁象嵌菊花文 盞), 5. 말 모양 토제품(土製馬), 6. 말 모양 철제품(鐵製馬)
 제주시 애월읍 항파두리성 출포품
7. 병(靑磁 小甁), 8. 청자편(靑磁 透刻文 片), 9. "고내촌"을 새긴 기와("高內村"字銘 瓦)
10. "만을 새긴 기와("卍"字銘 瓦), 11. 동전(元豊通寶), 12. 숟가락(靑銅匙)
제주시 애월읍 항파두리성 출포품
7. 병(靑磁 小甁), 8. 청자편(靑磁 透刻文 片), 9. "고내촌"을 새긴 기와("高內村"字銘 瓦)
10. "만을 새긴 기와("卍"字銘 瓦), 11. 동전(元豊通寶), 12. 숟가락(靑銅匙)


 원나라 관리가 쓰던 도장(靑銅 印)
원나라의 관인官印으로, 뒷면에 "정통선위사 도원수부겸핵사()"의 인장이라는 것과
"지원至元 22년(1285, 충렬왕 11) 2월에 원나라 중서예부中書禮部에서 만들었다" 는
내용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원나라 관리가 쓰던 도장(靑銅 印)
원나라의 관인官印으로, 뒷면에 "정통선위사 도원수부겸핵사()"의 인장이라는 것과
"지원至元 22년(1285, 충렬왕 11) 2월에 원나라 중서예부中書禮部에서 만들었다" 는
내용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딸을 공녀로 바친 왕족 부인의 묘지명(壽寧翁主 墓誌銘)
최해(崔瀣 1287~1340), 1335년(고려 충숙왕 복위 4), 1981년 입수
고려 왕족의 부인 수령옹주의 묘지이다. 수령옹주는 14살에 왕은王恩과 혼인했으나
29살에 남편을 여의고 3남 1녀를 홀로 키웠다. 그러던 중 고명딸을 원나라에 공녀로 보내게 되자
그 슬픔으로 병이나서 1335년 55세에 죽었다. 아들 회안군 순이 충숙왕의 즉위에 예를 다하여
모신 공으로 그 해(1313년) 그녀에게 '수령'이란 호가 내려졌다. 이 묘지명을 통해 왕족의 여자들도
원나라에 공녀로 바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뽑혀서 서쪽(원나라)으로 들어가기를 거른 적이 없었다.
비록 왕실 친족같이 귀한 신분이라도 (자식을)숨길 수 없고,
어미와 자식이 한 번 이별하면 아득하게 만날 기약이 없었다.
東方子女被刮西去無處年 雖王親之實 不得匿 母子一離 杳無會期
*공녀(貢女)
충렬왕1년(1275) 10명의 고려여성을 원나라에 보낸 이래 공민왕대에 이르기까지 약 80년 간
처녀진공사의 왕래가 50회를 넘었다. 공녀의 대상은 대개 13~16살의 미혼 여성으로,
평민은 물론이고 왕족의 여성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에서는 조혼의 풍습까지 생겨났고,
고려 조정은 아예 금혼령을 내리거나 결혼도감.과부처녀추고도감 등을 설치하여공녀의 안정적
차출을 꾀하였다.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들은 원나라 황실의 궁녀, 고관들의 시첩.시비시비 등에 충당되거나
군인들과 집단 혼인을 하기도 하였다. 고관과 혼인한 예도 있고, 드물게는 원나라 황제와
혼인하기도 하였다. 원나라 인종의 편비였다가 후에 황후가 된 관리 김심의 딸이나,
나중에 순제의 제2황후로서 황태자까지 낳은 관리 기자오의 딸이 그러하다.
기황후의 일족은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탐학과 횡포를 자행하다가 공민왕 때에
숙청되었다.
딸을 공녀로 바친 왕족 부인의 묘지명(壽寧翁主 墓誌銘)
최해(崔瀣 1287~1340), 1335년(고려 충숙왕 복위 4), 1981년 입수
고려 왕족의 부인 수령옹주의 묘지이다. 수령옹주는 14살에 왕은王恩과 혼인했으나
29살에 남편을 여의고 3남 1녀를 홀로 키웠다. 그러던 중 고명딸을 원나라에 공녀로 보내게 되자
그 슬픔으로 병이나서 1335년 55세에 죽었다. 아들 회안군 순이 충숙왕의 즉위에 예를 다하여
모신 공으로 그 해(1313년) 그녀에게 '수령'이란 호가 내려졌다. 이 묘지명을 통해 왕족의 여자들도
원나라에 공녀로 바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뽑혀서 서쪽(원나라)으로 들어가기를 거른 적이 없었다.
비록 왕실 친족같이 귀한 신분이라도 (자식을)숨길 수 없고,
어미와 자식이 한 번 이별하면 아득하게 만날 기약이 없었다.
東方子女被刮西去無處年 雖王親之實 不得匿 母子一離 杳無會期
*공녀(貢女)
충렬왕1년(1275) 10명의 고려여성을 원나라에 보낸 이래 공민왕대에 이르기까지 약 80년 간
처녀진공사의 왕래가 50회를 넘었다. 공녀의 대상은 대개 13~16살의 미혼 여성으로,
평민은 물론이고 왕족의 여성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에서는 조혼의 풍습까지 생겨났고,
고려 조정은 아예 금혼령을 내리거나 결혼도감.과부처녀추고도감 등을 설치하여공녀의 안정적
차출을 꾀하였다.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들은 원나라 황실의 궁녀, 고관들의 시첩.시비시비 등에 충당되거나
군인들과 집단 혼인을 하기도 하였다. 고관과 혼인한 예도 있고, 드물게는 원나라 황제와
혼인하기도 하였다. 원나라 인종의 편비였다가 후에 황후가 된 관리 김심의 딸이나,
나중에 순제의 제2황후로서 황태자까지 낳은 관리 기자오의 딸이 그러하다.
기황후의 일족은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탐학과 횡포를 자행하다가 공민왕 때에
숙청되었다.



 공민왕이 썼다는 안동 현판 글씨의 탁본(傳 恭愍王 筆 懸板 拓本帖)
공민왕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안동 영호루 및 안동도호부 관아의 현판 글씨를 탁본하여
첩으로 만든 것이다. 이 글씨는 1361년(공민왕 10) 에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갔던 공민왕의 쓴 것으로 전해진다.
공민왕이 썼다는 안동 현판 글씨의 탁본(傳 恭愍王 筆 懸板 拓本帖)
공민왕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안동 영호루 및 안동도호부 관아의 현판 글씨를 탁본하여
첩으로 만든 것이다. 이 글씨는 1361년(공민왕 10) 에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갔던 공민왕의 쓴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 실물 금속활자 -'복(복-山+復-)'자
고려시대 실물 금속활자 -'복(복-山+復-)'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고려에서 금속 활자를 사용한 것은 1236년(고종 26) 목판으로 펴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원래 금속 활자본인데 목판으로 다시 인쇄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3세기 전반기에 이미 고려에서 금속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한다는 기록이 있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고려에서 금속 활자를 사용한 것은 1236년(고종 26) 목판으로 펴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원래 금속 활자본인데 목판으로 다시 인쇄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3세기 전반기에 이미 고려에서 금속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한다는 기록이 있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팔만대장경판으로 인쇄한 학습용 불교 사전(經律異相)
고려후기~조선전기, 2003년 송성문 기증, 보물 1126호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기위해 새긴 팔만대장경 가운데 [경률이상] 제8권의 인쇄본이다.
[經律異相]은 중국 양나라의 승려 승민.보창 등이 편찬한 일종의 불교사전으로,
1243년(고종 30)에 남해에 분사대장도감에서 새긴 경판을 후대에 인쇄한 판본이다.
팔만대장경판으로 인쇄한 학습용 불교 사전(經律異相)
고려후기~조선전기, 2003년 송성문 기증, 보물 1126호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기위해 새긴 팔만대장경 가운데 [경률이상] 제8권의 인쇄본이다.
[經律異相]은 중국 양나라의 승려 승민.보창 등이 편찬한 일종의 불교사전으로,
1243년(고종 30)에 남해에 분사대장도감에서 새긴 경판을 후대에 인쇄한 판본이다.
 고려의 인쇄 문화
고려시대 인쇄 기술은 불교의 융성과 함께 크게 발전하여 사원이 출판 활동에 중심이 되었다.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고승과 그들을 따르는 문도들은 사원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문적 경험과 인력을 동원하여 활발한 출판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사원의 출판 활동은 종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제재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고려의 인쇄 문화
고려시대 인쇄 기술은 불교의 융성과 함께 크게 발전하여 사원이 출판 활동에 중심이 되었다.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고승과 그들을 따르는 문도들은 사원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문적 경험과 인력을 동원하여 활발한 출판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사원의 출판 활동은 종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제재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고려 후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보물 1426호
이 수월관음도는 리움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도와 같은 도상으로 그렸으나 화면에서 관음보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배경으로 그려진 대나무 옆으로 관음보살이 반투명 베일을 걸치고
암좌 위에 앉아 있다. 암좌의 끝 쪽에는 버드나무가 꽂힌 정병이 올려 있다. 관음보살을
부각시키면서도 대나무와 암좌의 배치를 효과적으로 하여 공간감을 보인다.
향 왼쪽 아래에는 합장한 모습으로 표현된 선재동자가 있다. 보살이 입은 반투명 베일에는
금니로 S자 형태의 당초문을 전체적으로 그려 화려함을 보인다.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명칭으로 표현된 '수월水月'은 688년 한역된 80권본 [화엄경]에
'수월중水月中'의 비유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정 불변된 실체가
없음을 뜻하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인 공空의 비유로 쓰이고 있다.
풀이 방석처럼 깔려 있는 암좌, 산호와 보주가 연꽃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연못의 표현 등은
80권본 [화엄경]을 근거로 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특징이다.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고려 후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보물 1426호
이 수월관음도는 리움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도와 같은 도상으로 그렸으나 화면에서 관음보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배경으로 그려진 대나무 옆으로 관음보살이 반투명 베일을 걸치고
암좌 위에 앉아 있다. 암좌의 끝 쪽에는 버드나무가 꽂힌 정병이 올려 있다. 관음보살을
부각시키면서도 대나무와 암좌의 배치를 효과적으로 하여 공간감을 보인다.
향 왼쪽 아래에는 합장한 모습으로 표현된 선재동자가 있다. 보살이 입은 반투명 베일에는
금니로 S자 형태의 당초문을 전체적으로 그려 화려함을 보인다.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명칭으로 표현된 '수월水月'은 688년 한역된 80권본 [화엄경]에
'수월중水月中'의 비유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정 불변된 실체가
없음을 뜻하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인 공空의 비유로 쓰이고 있다.
풀이 방석처럼 깔려 있는 암좌, 산호와 보주가 연꽃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연못의 표현 등은
80권본 [화엄경]을 근거로 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특징이다.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고려 14세기, 삼성미술관 Leeum소장, 보물 926호
부처의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덜어 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생의 부름에 답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또는 축약하여 관음보살로 불렀다.
관음보살은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불교를 믿는 곳에서
널리 신앙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화엄경華嚴經]의 유행으로 투명한 베일을 걸친
관음보살이 정토淨土의 연못 암좌에 앉아, 보살도菩薩道를 구하러 찾아온 선재동자善財童子를
그윽이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이다.
그리고 보살로 부르는 어떤중생이라도 가서 구제해주는 그의 실천을, 맑은 물이 있으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달에 비유하여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로 칭하였다.
큰 원광圓光안에는기암괴석 위에 반가좌로 앉은 모습을 깊고 우아한 채색과 정교한 필선으로 그렸다.
화면 하단에는 선재동자가 합장하고 있다. 동자의 위쪽으로는 관음보살이 머무는 정토를 상징하는
연꽃, 산호 등을 묘사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 전면 개편 제3편으로 "고려 2실" 무신정권과 대몽항쟁,공민왕과 개혁정치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고려 2실" 불교문화와 불교미술, 성리학의 도입, 새왕조의 여명을 제 4편으로
편집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진과 글
권진순
2016년 1월 12일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고려 14세기, 삼성미술관 Leeum소장, 보물 926호
부처의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덜어 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생의 부름에 답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또는 축약하여 관음보살로 불렀다.
관음보살은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불교를 믿는 곳에서
널리 신앙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화엄경華嚴經]의 유행으로 투명한 베일을 걸친
관음보살이 정토淨土의 연못 암좌에 앉아, 보살도菩薩道를 구하러 찾아온 선재동자善財童子를
그윽이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이다.
그리고 보살로 부르는 어떤중생이라도 가서 구제해주는 그의 실천을, 맑은 물이 있으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달에 비유하여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로 칭하였다.
큰 원광圓光안에는기암괴석 위에 반가좌로 앉은 모습을 깊고 우아한 채색과 정교한 필선으로 그렸다.
화면 하단에는 선재동자가 합장하고 있다. 동자의 위쪽으로는 관음보살이 머무는 정토를 상징하는
연꽃, 산호 등을 묘사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 전면 개편 제3편으로 "고려 2실" 무신정권과 대몽항쟁,공민왕과 개혁정치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고려 2실" 불교문화와 불교미술, 성리학의 도입, 새왕조의 여명을 제 4편으로
편집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진과 글
권진순
2016년 1월 12일






경전함(나전 경함螺鈿經函) 고려 후기, 2014년 (사)국립중앙박물관회 기증 나전으로 만든 대장경을 담은 상자이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유사한 형태의 나전경함은 세계적으로 8점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 상자에는 주로 모란당초 무늬가 표현되었고, 총 2만 5천여 개의 자개가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자개를 가늘게 잘라내어 무늬를 만들었다. 골회 옻칠과 검은 옻칠을 여러번 발라 도장하여 나무의 뒤틀림과 갈라짐을 방지하였다.




청자 도교 인물 모양 주전자(靑磁 道釋人物形 注子) 국보 제167호, 높이 28.0cm, 바닥지름 19.7cm, 대구광역시 동구 내동 출토, 1977년 입수 인물의 형상을 정교하게 본떠 만든 완전한 형태의 사람 모양 주자이다. 보관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복숭아를 담은 바구니를 받쳐 들고서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도사道士나 전설 속의 서왕모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왕모는 곤륜산 정상에 있는 궁에 기거하며 불로불사와 신선 세계를 주관한다고 한다. 고려시대 도교의 성행과 함께 도교적 색채를 띠는 상형청자가 많이 제작되었다.
대나무 무늬 주자와 승반(靑磁 陽刻 竹節文 注子.承盤) 고려 12세기 상형청자의 멋을 잘 보여주는 죽절형 주자와 승반이다. 댓가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다듬은 모양의 몸체에 대나무 모양의 주구注口와 손잡이가 달려 있다. 대나무 마디 마디의 곁면 자국을 표현하여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뚜껑은 몸체와 그대로 이어지도록 선이나 문양 구성에서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보이며, 뚜껑 꼭지와 손잡이 윗부분에 서로 끈을 꿰어 맬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다. "고려 2실"
무신정권과 강화 천도 12세기 귀족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사회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드러내었다. 문신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의 불만은 의종의 사치스런 생활과 실정으로 폭발되어 마침내 1170년(의종 24)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정중부가 주도하던 무신정권은 경대승-이의민으로 이어졌고 1196년(명종26) 최충헌이 집권하면서 최우(뒤에 최이로 개명)-최항-최의의 4대에 이르는 최씨 정권이 성립하였다. 1231년(고종 18)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자, 이듬해 최이는 항전을 결의하며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선후기 고려 후기 문인 이규보의 문집이다. 이 문집에는 그의 문학성이 돋보이는 시뿐만 아니라 당대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글들도 함께 수록되었다. 대서사시 [동명왕편] 술을 의인화한 [국선생전] 팔만대장경 판각의 연혁을 알게 해주는 [대장경각기고문] 등은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되는 글이다. 이규보는 과거에 응시하여 3번의 낙방을 거쳐 23세에 합격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중앙관료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41세 때였다. 늦게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최씨 무신정권기의 대표적 문신이었다. 금림의 버들에 의탁하길 기대하오니 원컨대 긴 가지 하나를 빌려주소서 禁林期託柳 願借一長條 [동국이상국집] 권2, 정유승선呈柳承宣 (이규보가 당시 고위 관리엿던 유승선에게 관직을 구하는 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풀이한 글(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 別行疏) 1387년(고려 우왕 13), 2003년 송성문 기증, 보물 1126호 [화엄경] 가운데 보현보살의 행원행원을 기록한 [보현행원품]을 징관이 해설한 글이다. 1256년(고종 43)에 최우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책을 1387년(우왕 13)에 다시 새겨 찍은 것으로, 이색이 발문을 지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이 융성하였고 그 가운데 특히 보현보살의 열 가지 실천행을 담은 [보현행원품]을 별도의 책으로 간행하여 즐겨 독송하였다.


1. 단지, 2. 매병, 3. 잔(靑磁象嵌菊花文盞),강화읍 남산리 발견,1980년 입수 삼별초와 대몽 항쟁 몽골군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나 고려 정부는 몽골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였으며, 결국 1258년(고종 45)에는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정변이 일어났다. 다음해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졌고, 1270년(원종11)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무신 정권의 군사적 뒷받침이 되었던 삼별초는 이에 반발하며 항몽 정권을 수립하고, 진도의 용장산성, 제주도의 항파두리성을 거점으로 대몽 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273년(원종 14) 고려와 원의 연합군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되어 40여년만에 걸친 대몽 항쟁이 막을 내렸다.

진도 용장산성 출토품(龍藏山城 出土品) 수막새(瓦當)
진도 용장산성 출토품 "사도四道"를 새긴 기와("四道"銘 瓦), "대장혜大匠惠"를 새긴 기와("大匠惠'銘 瓦)
진도 용장산성 출토품 4. 잔(靑磁象嵌菊花文 盞), 5. 말 모양 토제품(土製馬), 6. 말 모양 철제품(鐵製馬)
제주시 애월읍 항파두리성 출포품 7. 병(靑磁 小甁), 8. 청자편(靑磁 透刻文 片), 9. "고내촌"을 새긴 기와("高內村"字銘 瓦) 10. "만을 새긴 기와("卍"字銘 瓦), 11. 동전(元豊通寶), 12. 숟가락(靑銅匙)


원나라 관리가 쓰던 도장(靑銅 印) 원나라의 관인官印으로, 뒷면에 "정통선위사 도원수부겸핵사()"의 인장이라는 것과 "지원至元 22년(1285, 충렬왕 11) 2월에 원나라 중서예부中書禮部에서 만들었다" 는 내용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딸을 공녀로 바친 왕족 부인의 묘지명(壽寧翁主 墓誌銘) 최해(崔瀣 1287~1340), 1335년(고려 충숙왕 복위 4), 1981년 입수 고려 왕족의 부인 수령옹주의 묘지이다. 수령옹주는 14살에 왕은王恩과 혼인했으나 29살에 남편을 여의고 3남 1녀를 홀로 키웠다. 그러던 중 고명딸을 원나라에 공녀로 보내게 되자 그 슬픔으로 병이나서 1335년 55세에 죽었다. 아들 회안군 순이 충숙왕의 즉위에 예를 다하여 모신 공으로 그 해(1313년) 그녀에게 '수령'이란 호가 내려졌다. 이 묘지명을 통해 왕족의 여자들도 원나라에 공녀로 바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뽑혀서 서쪽(원나라)으로 들어가기를 거른 적이 없었다. 비록 왕실 친족같이 귀한 신분이라도 (자식을)숨길 수 없고, 어미와 자식이 한 번 이별하면 아득하게 만날 기약이 없었다. 東方子女被刮西去無處年 雖王親之實 不得匿 母子一離 杳無會期 *공녀(貢女) 충렬왕1년(1275) 10명의 고려여성을 원나라에 보낸 이래 공민왕대에 이르기까지 약 80년 간 처녀진공사의 왕래가 50회를 넘었다. 공녀의 대상은 대개 13~16살의 미혼 여성으로, 평민은 물론이고 왕족의 여성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에서는 조혼의 풍습까지 생겨났고, 고려 조정은 아예 금혼령을 내리거나 결혼도감.과부처녀추고도감 등을 설치하여공녀의 안정적 차출을 꾀하였다.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들은 원나라 황실의 궁녀, 고관들의 시첩.시비시비 등에 충당되거나 군인들과 집단 혼인을 하기도 하였다. 고관과 혼인한 예도 있고, 드물게는 원나라 황제와 혼인하기도 하였다. 원나라 인종의 편비였다가 후에 황후가 된 관리 김심의 딸이나, 나중에 순제의 제2황후로서 황태자까지 낳은 관리 기자오의 딸이 그러하다. 기황후의 일족은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탐학과 횡포를 자행하다가 공민왕 때에 숙청되었다.



공민왕이 썼다는 안동 현판 글씨의 탁본(傳 恭愍王 筆 懸板 拓本帖) 공민왕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안동 영호루 및 안동도호부 관아의 현판 글씨를 탁본하여 첩으로 만든 것이다. 이 글씨는 1361년(공민왕 10) 에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갔던 공민왕의 쓴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 실물 금속활자 -'복(복-山+復-)'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고려에서 금속 활자를 사용한 것은 1236년(고종 26) 목판으로 펴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원래 금속 활자본인데 목판으로 다시 인쇄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3세기 전반기에 이미 고려에서 금속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한다는 기록이 있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팔만대장경판으로 인쇄한 학습용 불교 사전(經律異相) 고려후기~조선전기, 2003년 송성문 기증, 보물 1126호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기위해 새긴 팔만대장경 가운데 [경률이상] 제8권의 인쇄본이다. [經律異相]은 중국 양나라의 승려 승민.보창 등이 편찬한 일종의 불교사전으로, 1243년(고종 30)에 남해에 분사대장도감에서 새긴 경판을 후대에 인쇄한 판본이다.
고려의 인쇄 문화 고려시대 인쇄 기술은 불교의 융성과 함께 크게 발전하여 사원이 출판 활동에 중심이 되었다.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고승과 그들을 따르는 문도들은 사원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문적 경험과 인력을 동원하여 활발한 출판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사원의 출판 활동은 종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제재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고려 후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보물 1426호 이 수월관음도는 리움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도와 같은 도상으로 그렸으나 화면에서 관음보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배경으로 그려진 대나무 옆으로 관음보살이 반투명 베일을 걸치고 암좌 위에 앉아 있다. 암좌의 끝 쪽에는 버드나무가 꽂힌 정병이 올려 있다. 관음보살을 부각시키면서도 대나무와 암좌의 배치를 효과적으로 하여 공간감을 보인다. 향 왼쪽 아래에는 합장한 모습으로 표현된 선재동자가 있다. 보살이 입은 반투명 베일에는 금니로 S자 형태의 당초문을 전체적으로 그려 화려함을 보인다.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명칭으로 표현된 '수월水月'은 688년 한역된 80권본 [화엄경]에 '수월중水月中'의 비유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정 불변된 실체가 없음을 뜻하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인 공空의 비유로 쓰이고 있다. 풀이 방석처럼 깔려 있는 암좌, 산호와 보주가 연꽃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연못의 표현 등은 80권본 [화엄경]을 근거로 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특징이다.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고려 14세기, 삼성미술관 Leeum소장, 보물 926호 부처의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덜어 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생의 부름에 답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또는 축약하여 관음보살로 불렀다. 관음보살은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불교를 믿는 곳에서 널리 신앙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화엄경華嚴經]의 유행으로 투명한 베일을 걸친 관음보살이 정토淨土의 연못 암좌에 앉아, 보살도菩薩道를 구하러 찾아온 선재동자善財童子를 그윽이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이다. 그리고 보살로 부르는 어떤중생이라도 가서 구제해주는 그의 실천을, 맑은 물이 있으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달에 비유하여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로 칭하였다. 큰 원광圓光안에는기암괴석 위에 반가좌로 앉은 모습을 깊고 우아한 채색과 정교한 필선으로 그렸다. 화면 하단에는 선재동자가 합장하고 있다. 동자의 위쪽으로는 관음보살이 머무는 정토를 상징하는 연꽃, 산호 등을 묘사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 전면 개편 제3편으로 "고려 2실" 무신정권과 대몽항쟁,공민왕과 개혁정치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고려 2실" 불교문화와 불교미술, 성리학의 도입, 새왕조의 여명을 제 4편으로 편집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진과 글 권진순 2016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