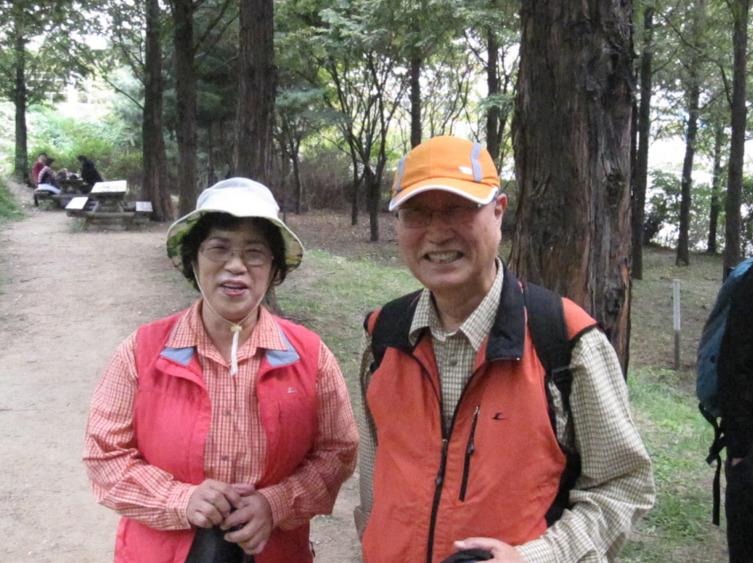조선 청화(朝鮮 靑畫),
푸른빛에 물들다, 기획전-2
일본 아리타(有田)의 청화백자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기 생산지인 아리타는 16세기 말까지는 여느 시골의
작은 마을과 다름이 없었다. 임진왜란.정유재란이후 당시 아리타가 속한 사가(佐賀)의
藩主인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는 조선인 장인 沙器匠들을 가장 많이 잡아갔다.
이러한 조선의 장인들에 의하여 아리타야키(有田燒), 다카토리야키(高取燒), 아가노야키
(上野燒), 야쓰시로야키(八代燒)등의 도예명문 유파가 형성되어 일본 도자기의
원류를 이루었다.
아리타에 정착한 조선의 장인 가운데 일본 도자기의 시조가 된 李參平(?~1656,이삼평 일본명
가나가에 산베이,金케江三兵衛)같이 그 이름이 남겨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는 1594년 경
나베시마에의해 일본으로 끌려가 가라쓰(唐津)근방에서 다쿠고가라쓰(多久古唐津)라는 도기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17세기초에는 아리타에서 백자광을 발견하고 덴구다니 가마(天狗谷窯)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본 자기의 시초가 되었다.
특히 이삼평이 이즈미야마(泉山)에서 백토가 매장된 광산을 발견한 사건은 도자기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아리타에는 이삼평을 신으로 모시는 도잔 신사(陶山神社)와
陶祖 이삼평의 묘라고 새겨진 기념비가 전한다.
17세기 초 아리타의 도자 장인은 백자를 비롯하여 청화백자 제작에 성공하며 기술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651년부터 네델란드의 동인도회사를 통하여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여
1664년에는 45,000개를 수출하여 많은 수입을 올렸다. 아리타 자기는 수출항인 이마리(伊萬里)의
이름을 따서 이마리야키(伊萬里燒)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다.





 아리타의 초기 청화백자는 조선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청자토끼무늬 전접시>의
구연은 평평하게 껵여 넓은 전(搌)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예는 조선백자의 전접시(搌楪匙)
에서도 나타난다.문양의 측면에서는 장식부분에 형지(型紙)를 붙힌 후 코발트 안료를 뿜어서
문양을 나타낸 취묵(吹墨)기법으로 하얀 토끼와 정자, 구름을 표현하였다.
아리타의 초기 청화백자는 조선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청자토끼무늬 전접시>의
구연은 평평하게 껵여 넓은 전(搌)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예는 조선백자의 전접시(搌楪匙)
에서도 나타난다.문양의 측면에서는 장식부분에 형지(型紙)를 붙힌 후 코발트 안료를 뿜어서
문양을 나타낸 취묵(吹墨)기법으로 하얀 토끼와 정자, 구름을 표현하였다.

 <그물무늬 접시>는 앞뒷면에 그물을 형상화한 문양을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그물무늬는
물고기나 새우 등이 함께 담긴 어망을 표현한 중국 명대 말의 청화백자나 덴가이아카에
(天啓赤繪)로 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 접시에는 그물문만 그려져 있는데 단순한 문양구성에 의한
청색의 패턴과 순백의 바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층 돋보인다.
<그물무늬 접시>는 앞뒷면에 그물을 형상화한 문양을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그물무늬는
물고기나 새우 등이 함께 담긴 어망을 표현한 중국 명대 말의 청화백자나 덴가이아카에
(天啓赤繪)로 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 접시에는 그물문만 그려져 있는데 단순한 문양구성에 의한
청색의 패턴과 순백의 바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층 돋보인다.

 <학 거북무늬 접시>는 노조메(濃染메) 농담(濃淡)의 조화를 활용하여 장수의 상징인 거북과 학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거북의 호흡 표현은 청자유를 입혀 더욱 기교적인 느낌이 들며,
이러한 문양 소재는 조선 후기 청화백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 거북무늬 접시>는 노조메(濃染메) 농담(濃淡)의 조화를 활용하여 장수의 상징인 거북과 학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거북의 호흡 표현은 청자유를 입혀 더욱 기교적인 느낌이 들며,
이러한 문양 소재는 조선 후기 청화백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벗풀 백로무늬 접시(染付 澤瀉니鷺文 輪花 大皿), 일본 애도(江戶)19세기, 이마리(伊万里),
높이 5.2cm, 입지름 32.1cm,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히라노 코스케(平野耕輔)기증
벗풀 백로무늬 접시(染付 澤瀉니鷺文 輪花 大皿), 일본 애도(江戶)19세기, 이마리(伊万里),
높이 5.2cm, 입지름 32.1cm,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히라노 코스케(平野耕輔)기증
 꽃무늬 접시(靑花 花卉文 皿), 중국명 영락년간(1403~1424), 입지름 67.6cm, 이데미쓰(出光)미술관 소장
꽃무늬 접시(靑花 花卉文 皿), 중국명 영락년간(1403~1424), 입지름 67.6cm, 이데미쓰(出光)미술관 소장


 파도 용무늬 편병(靑花 龍波濤文 扁甁), 중국 명 영락년간(1403~1424), 높이 45.0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스미토모(住友)그룹 기증
파도 용무늬 편병(靑花 龍波濤文 扁甁), 중국 명 영락년간(1403~1424), 높이 45.0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스미토모(住友)그룹 기증
 의소세손 의령원 부장품(懿昭世孫 懿寧園 副葬品), 조선 1752년경, 높이 16.0cm
의소세손은 사도세자와 혜빈 홍씨의 장자로 정조의 형이다. 1751년 영조27년에 세손으로
책봉되었으나 이듬해인 1752년 어린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의령원에 묻쳤다.
의손세손의 명기는 제기의 일종인 '簠보'와 '簋궤'를 비롯하여 직립한 立壺형태의 백자항아리,
壽, 福 등의 글자와 칠보, 매화 등을 청화 안료로 장식한 합과 항아리, 등나무 무늬를
알록달록한 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소세손 의령원 부장품(懿昭世孫 懿寧園 副葬品), 조선 1752년경, 높이 16.0cm
의소세손은 사도세자와 혜빈 홍씨의 장자로 정조의 형이다. 1751년 영조27년에 세손으로
책봉되었으나 이듬해인 1752년 어린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의령원에 묻쳤다.
의손세손의 명기는 제기의 일종인 '簠보'와 '簋궤'를 비롯하여 직립한 立壺형태의 백자항아리,
壽, 福 등의 글자와 칠보, 매화 등을 청화 안료로 장식한 합과 항아리, 등나무 무늬를
알록달록한 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유옹주 묘 부장품(和柔翁主 墓 副葬品), 조선 1777년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조의 열 번째 딸로 문신 황인점과 혼인한 화유옹주는 1777년 사망하여 경기도 부천에 안장되었으며,
1802년 황인점이 사망한 뒤 합장되었다.합장묘의 명기는 도자기를 비롯한 옥제비녀, 은주전자 등이며
총 30점이 넘는다. 이 중 도자기는 청화 안료로 장식한 합과 등나무 무늬를 화려한 색으로
장식한 합과 잔이 포함되어 있다.
화유옹주 묘 부장품(和柔翁主 墓 副葬品), 조선 1777년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조의 열 번째 딸로 문신 황인점과 혼인한 화유옹주는 1777년 사망하여 경기도 부천에 안장되었으며,
1802년 황인점이 사망한 뒤 합장되었다.합장묘의 명기는 도자기를 비롯한 옥제비녀, 은주전자 등이며
총 30점이 넘는다. 이 중 도자기는 청화 안료로 장식한 합과 등나무 무늬를 화려한 색으로
장식한 합과 잔이 포함되어 있다.
 원빈 홍씨 묘 부장품(元嬪洪氏 墓 副葬品), 조선 1779년경
정조의 첫번째 후궁인 원빈홍씨는 홍국영의 여동생이다. 1778년 후궁으로 간택된 지 1년만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원빈 홍씨의 무덤은 고양시 원당동의 서삼릉 권역내 후궁 묘역에 안치되어 있다.
부장된 명기는 순백자와 장식백자로 구분되는데, 순백자는 '보'와 '궤'를 비롯하여 병,합,탁잔,향로,
그리고 편경編磬으로 보이는 '경'이 있다.
원빈 홍씨 묘 부장품(元嬪洪氏 墓 副葬品), 조선 1779년경
정조의 첫번째 후궁인 원빈홍씨는 홍국영의 여동생이다. 1778년 후궁으로 간택된 지 1년만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원빈 홍씨의 무덤은 고양시 원당동의 서삼릉 권역내 후궁 묘역에 안치되어 있다.
부장된 명기는 순백자와 장식백자로 구분되는데, 순백자는 '보'와 '궤'를 비롯하여 병,합,탁잔,향로,
그리고 편경編磬으로 보이는 '경'이 있다.
 此細畫五幅 卽我今上殿下曩在潛邸 提擧廚院時所作也
嘗有一胥隸 告往燔造所 上輒取座間油紙 輒作六片如掌大 以水墨點梁 斯順而盡山水者二
蘭草者一 菊花者一 梅花者二 付其隸而命之曰 汝以此燔小壺而來 隸卽如敎以獻云
이 작은 그림 5폭은 우리 금상 전하(英祖)께서 잠저에 계시면서 주원(廚院)의 제거(提擧)를
맡아보실 떄 그린 것이다. 일찍이 어떤 관헌이 변조소에 간다고 고하기에, 상께서 문득
앉은 자리의 유지(油紙)를 가져다 손바닥 크기로 6조각을 잘라 수묵으로 그리셨다.
잠깐만에 마쳤는데 산수가 둘, 난초가 하나, 국화가 하나, 매화가 둘이었다.
관원에게 주시며 '너는 이것으로 작은 항아리를 구워 오너라' 명하셨고,
관원은 곧 하교대로 해다 바쳤다.
金時敏(1681~1747), [謹題御畫帖子後], [東圃集] 卷7中
此細畫五幅 卽我今上殿下曩在潛邸 提擧廚院時所作也
嘗有一胥隸 告往燔造所 上輒取座間油紙 輒作六片如掌大 以水墨點梁 斯順而盡山水者二
蘭草者一 菊花者一 梅花者二 付其隸而命之曰 汝以此燔小壺而來 隸卽如敎以獻云
이 작은 그림 5폭은 우리 금상 전하(英祖)께서 잠저에 계시면서 주원(廚院)의 제거(提擧)를
맡아보실 떄 그린 것이다. 일찍이 어떤 관헌이 변조소에 간다고 고하기에, 상께서 문득
앉은 자리의 유지(油紙)를 가져다 손바닥 크기로 6조각을 잘라 수묵으로 그리셨다.
잠깐만에 마쳤는데 산수가 둘, 난초가 하나, 국화가 하나, 매화가 둘이었다.
관원에게 주시며 '너는 이것으로 작은 항아리를 구워 오너라' 명하셨고,
관원은 곧 하교대로 해다 바쳤다.
金時敏(1681~1747), [謹題御畫帖子後], [東圃集] 卷7中




 난초무늬표주박모양 병(白磁靑畵蘭草文瓢形甁), 조선18세기, 높이 21.1cm, 보물 제1058호
1975년 박병래 기증
난초무늬표주박모양 병(白磁靑畵蘭草文瓢形甁), 조선18세기, 높이 21.1cm, 보물 제1058호
1975년 박병래 기증


 '병신'이 쓰여진 산수무늬 병(白磁靑畵山水文丙申銘 角甁), 조선1776년, 높이 22.2cm, 삼성미술관
'병신'이 쓰여진 산수무늬 병(白磁靑畵山水文丙申銘 角甁), 조선1776년, 높이 22.2cm, 삼성미술관


 시가 쓰여진 산수무늬 연적(白磁靑畵山水文詩銘八角硯滴), 조선 19세기, 높이12.6cm, 보물제1329호
윗면에는 구름 용 무늬가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고 7개의 옆면에 瀟湘八景이 그려져 있다.
出水口가 있는 면 중앙에 '洞庭秋月'이라고 주제를 적고 그 양 옆에 '松下問童子' '張翰江東去'시구를
적어 놓았다.'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묻다'는 中唐 때 시인 가도(賈島)의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尋隱者不遇)에서,'장한강동거'는 성당 때 시선 이백의 [강동으로 떠나는 장사인을 보내며
(送張舍人之江東)에서 발췌한 것이다.
시가 쓰여진 산수무늬 연적(白磁靑畵山水文詩銘八角硯滴), 조선 19세기, 높이12.6cm, 보물제1329호
윗면에는 구름 용 무늬가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고 7개의 옆면에 瀟湘八景이 그려져 있다.
出水口가 있는 면 중앙에 '洞庭秋月'이라고 주제를 적고 그 양 옆에 '松下問童子' '張翰江東去'시구를
적어 놓았다.'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묻다'는 中唐 때 시인 가도(賈島)의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尋隱者不遇)에서,'장한강동거'는 성당 때 시선 이백의 [강동으로 떠나는 장사인을 보내며
(送張舍人之江東)에서 발췌한 것이다.
 산수 인물무늬 항아리(白磁靑畵山水人物文 壺), 조선18세기, 높이44.5cm
소나무 혹은 잣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道人이 바위에 앉아 물가를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관폭도(觀瀑圖)의 도상이다.
산수 인물무늬 항아리(白磁靑畵山水人物文 壺), 조선18세기, 높이44.5cm
소나무 혹은 잣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道人이 바위에 앉아 물가를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관폭도(觀瀑圖)의 도상이다.



 시가 쓰여진 전접시(白磁 靑畵 詩銘文 搌楪匙), 조선 15~16세기, 높이 1.8cm, 입지름 21.2cm
지은이 불명인 行書體 七言詩
竹溪月冷陶令醉 -대나무 계곡에 달빛이 차가운데 도연명이 취해 있고,
花市風香李白眠 -꽃시장의 향기로운 바람 속에 이백이 잠들었네.
到頭世事情如夢 -세상사 돌아보면 품은 정은 꿈만 같고,
人間無飮似樽前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동이 앞에 있는 것 같네.
시가 쓰여진 전접시(白磁 靑畵 詩銘文 搌楪匙), 조선 15~16세기, 높이 1.8cm, 입지름 21.2cm
지은이 불명인 行書體 七言詩
竹溪月冷陶令醉 -대나무 계곡에 달빛이 차가운데 도연명이 취해 있고,
花市風香李白眠 -꽃시장의 향기로운 바람 속에 이백이 잠들었네.
到頭世事情如夢 -세상사 돌아보면 품은 정은 꿈만 같고,
人間無飮似樽前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동이 앞에 있는 것 같네.


 시가 쓰여진 나비무늬 연적은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편평한 윗면에 청화와 철화로 나비
한 마리를 아름답게 그리고 가운데에는 물구멍을 뚫었다. 밑면의 여덟 모서리에는 각각
작은 굽다리를 세웠다. 옆면은 한 모서리에 주둥이를 붙이고, 각 면에는 청화와 철화기법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칠언절구를 써 넣었다. 이 시는 李瑞雨(1633~1709)의 [河濱遺法歷周秦]을
고쳐 쓰면서 연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河濱遺質歷周秦 - 하빈에 남겨 놓은 질로 주진시대를 거쳐
呑吐淸波兩穴回 - 푸른 파도를 삼키고 토해 내며 양 구멍을 떠도네.
形靜玉山心藥水 - 형태는 옥으로 만든 산과 같고 마음은 심신을 치료하는 약수로세.
孰如其智孰如仁 - 남의 모자람을 미워하는 지혜가 나은가 가엾게 여기는 어짊이 나은가.
시가 쓰여진 나비무늬 연적은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편평한 윗면에 청화와 철화로 나비
한 마리를 아름답게 그리고 가운데에는 물구멍을 뚫었다. 밑면의 여덟 모서리에는 각각
작은 굽다리를 세웠다. 옆면은 한 모서리에 주둥이를 붙이고, 각 면에는 청화와 철화기법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칠언절구를 써 넣었다. 이 시는 李瑞雨(1633~1709)의 [河濱遺法歷周秦]을
고쳐 쓰면서 연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河濱遺質歷周秦 - 하빈에 남겨 놓은 질로 주진시대를 거쳐
呑吐淸波兩穴回 - 푸른 파도를 삼키고 토해 내며 양 구멍을 떠도네.
形靜玉山心藥水 - 형태는 옥으로 만든 산과 같고 마음은 심신을 치료하는 약수로세.
孰如其智孰如仁 - 남의 모자람을 미워하는 지혜가 나은가 가엾게 여기는 어짊이 나은가.


 호랑이 까치무늬 항아리(白磁 靑畵 虎鵲文 壺), 조선18~19세기, 높이44.1cm,
오사카시립도자미술관 소장
호랑이 까치무늬 항아리(白磁 靑畵 虎鵲文 壺), 조선18~19세기, 높이44.1cm,
오사카시립도자미술관 소장











 黃花叫賣遍街聲 - 국화꽃 파는 소리 온 거리 가득한데
樣樣年增譜外名 - 해마다 다른 모습[국보菊譜]밖의 이름일세
是菊皆陶籬下物 - 국화 모두 도연명의 울타리 밑 물건인데
就中何獨喚淵明 - 개중에 어이 홀로 연명이라 불리는가?
翠像朱欄鬪品形 - 푸른 화분 붉은 난간 품형品形을 다투거니
不堪紅紫濫芳馨 - 붉은빛 자주빛 짙은 향기 대단해라
竟知純潔偏多忌 - 순결함이 꺼림 받음 마침내 알겠구나
天亦慳成白鶴翎 - 하늘 또한 백학령白鶴翎을 간신히 만들었네
신위(申緯,1769~1845), [詠菊六絶句]중에서
[정민 교수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책속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2,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전-3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과 글, 권진순
조선 청화 도록을 참조하였습니다
2014년 10월5일
黃花叫賣遍街聲 - 국화꽃 파는 소리 온 거리 가득한데
樣樣年增譜外名 - 해마다 다른 모습[국보菊譜]밖의 이름일세
是菊皆陶籬下物 - 국화 모두 도연명의 울타리 밑 물건인데
就中何獨喚淵明 - 개중에 어이 홀로 연명이라 불리는가?
翠像朱欄鬪品形 - 푸른 화분 붉은 난간 품형品形을 다투거니
不堪紅紫濫芳馨 - 붉은빛 자주빛 짙은 향기 대단해라
竟知純潔偏多忌 - 순결함이 꺼림 받음 마침내 알겠구나
天亦慳成白鶴翎 - 하늘 또한 백학령白鶴翎을 간신히 만들었네
신위(申緯,1769~1845), [詠菊六絶句]중에서
[정민 교수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책속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2,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전-3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과 글, 권진순
조선 청화 도록을 참조하였습니다
2014년 10월5일





아리타의 초기 청화백자는 조선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청자토끼무늬 전접시>의 구연은 평평하게 껵여 넓은 전(搌)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예는 조선백자의 전접시(搌楪匙) 에서도 나타난다.문양의 측면에서는 장식부분에 형지(型紙)를 붙힌 후 코발트 안료를 뿜어서 문양을 나타낸 취묵(吹墨)기법으로 하얀 토끼와 정자, 구름을 표현하였다.

<그물무늬 접시>는 앞뒷면에 그물을 형상화한 문양을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그물무늬는 물고기나 새우 등이 함께 담긴 어망을 표현한 중국 명대 말의 청화백자나 덴가이아카에 (天啓赤繪)로 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 접시에는 그물문만 그려져 있는데 단순한 문양구성에 의한 청색의 패턴과 순백의 바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층 돋보인다.

<학 거북무늬 접시>는 노조메(濃染메) 농담(濃淡)의 조화를 활용하여 장수의 상징인 거북과 학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거북의 호흡 표현은 청자유를 입혀 더욱 기교적인 느낌이 들며, 이러한 문양 소재는 조선 후기 청화백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벗풀 백로무늬 접시(染付 澤瀉니鷺文 輪花 大皿), 일본 애도(江戶)19세기, 이마리(伊万里), 높이 5.2cm, 입지름 32.1cm,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히라노 코스케(平野耕輔)기증
꽃무늬 접시(靑花 花卉文 皿), 중국명 영락년간(1403~1424), 입지름 67.6cm, 이데미쓰(出光)미술관 소장


파도 용무늬 편병(靑花 龍波濤文 扁甁), 중국 명 영락년간(1403~1424), 높이 45.0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스미토모(住友)그룹 기증
의소세손 의령원 부장품(懿昭世孫 懿寧園 副葬品), 조선 1752년경, 높이 16.0cm 의소세손은 사도세자와 혜빈 홍씨의 장자로 정조의 형이다. 1751년 영조27년에 세손으로 책봉되었으나 이듬해인 1752년 어린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의령원에 묻쳤다. 의손세손의 명기는 제기의 일종인 '簠보'와 '簋궤'를 비롯하여 직립한 立壺형태의 백자항아리, 壽, 福 등의 글자와 칠보, 매화 등을 청화 안료로 장식한 합과 항아리, 등나무 무늬를 알록달록한 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유옹주 묘 부장품(和柔翁主 墓 副葬品), 조선 1777년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조의 열 번째 딸로 문신 황인점과 혼인한 화유옹주는 1777년 사망하여 경기도 부천에 안장되었으며, 1802년 황인점이 사망한 뒤 합장되었다.합장묘의 명기는 도자기를 비롯한 옥제비녀, 은주전자 등이며 총 30점이 넘는다. 이 중 도자기는 청화 안료로 장식한 합과 등나무 무늬를 화려한 색으로 장식한 합과 잔이 포함되어 있다.
원빈 홍씨 묘 부장품(元嬪洪氏 墓 副葬品), 조선 1779년경 정조의 첫번째 후궁인 원빈홍씨는 홍국영의 여동생이다. 1778년 후궁으로 간택된 지 1년만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원빈 홍씨의 무덤은 고양시 원당동의 서삼릉 권역내 후궁 묘역에 안치되어 있다. 부장된 명기는 순백자와 장식백자로 구분되는데, 순백자는 '보'와 '궤'를 비롯하여 병,합,탁잔,향로, 그리고 편경編磬으로 보이는 '경'이 있다.
此細畫五幅 卽我今上殿下曩在潛邸 提擧廚院時所作也 嘗有一胥隸 告往燔造所 上輒取座間油紙 輒作六片如掌大 以水墨點梁 斯順而盡山水者二 蘭草者一 菊花者一 梅花者二 付其隸而命之曰 汝以此燔小壺而來 隸卽如敎以獻云 이 작은 그림 5폭은 우리 금상 전하(英祖)께서 잠저에 계시면서 주원(廚院)의 제거(提擧)를 맡아보실 떄 그린 것이다. 일찍이 어떤 관헌이 변조소에 간다고 고하기에, 상께서 문득 앉은 자리의 유지(油紙)를 가져다 손바닥 크기로 6조각을 잘라 수묵으로 그리셨다. 잠깐만에 마쳤는데 산수가 둘, 난초가 하나, 국화가 하나, 매화가 둘이었다. 관원에게 주시며 '너는 이것으로 작은 항아리를 구워 오너라' 명하셨고, 관원은 곧 하교대로 해다 바쳤다. 金時敏(1681~1747), [謹題御畫帖子後], [東圃集] 卷7中




난초무늬표주박모양 병(白磁靑畵蘭草文瓢形甁), 조선18세기, 높이 21.1cm, 보물 제1058호 1975년 박병래 기증


'병신'이 쓰여진 산수무늬 병(白磁靑畵山水文丙申銘 角甁), 조선1776년, 높이 22.2cm, 삼성미술관


시가 쓰여진 산수무늬 연적(白磁靑畵山水文詩銘八角硯滴), 조선 19세기, 높이12.6cm, 보물제1329호 윗면에는 구름 용 무늬가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고 7개의 옆면에 瀟湘八景이 그려져 있다. 出水口가 있는 면 중앙에 '洞庭秋月'이라고 주제를 적고 그 양 옆에 '松下問童子' '張翰江東去'시구를 적어 놓았다.'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묻다'는 中唐 때 시인 가도(賈島)의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尋隱者不遇)에서,'장한강동거'는 성당 때 시선 이백의 [강동으로 떠나는 장사인을 보내며 (送張舍人之江東)에서 발췌한 것이다.
산수 인물무늬 항아리(白磁靑畵山水人物文 壺), 조선18세기, 높이44.5cm 소나무 혹은 잣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道人이 바위에 앉아 물가를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관폭도(觀瀑圖)의 도상이다.



시가 쓰여진 전접시(白磁 靑畵 詩銘文 搌楪匙), 조선 15~16세기, 높이 1.8cm, 입지름 21.2cm 지은이 불명인 行書體 七言詩 竹溪月冷陶令醉 -대나무 계곡에 달빛이 차가운데 도연명이 취해 있고, 花市風香李白眠 -꽃시장의 향기로운 바람 속에 이백이 잠들었네. 到頭世事情如夢 -세상사 돌아보면 품은 정은 꿈만 같고, 人間無飮似樽前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동이 앞에 있는 것 같네.


시가 쓰여진 나비무늬 연적은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편평한 윗면에 청화와 철화로 나비 한 마리를 아름답게 그리고 가운데에는 물구멍을 뚫었다. 밑면의 여덟 모서리에는 각각 작은 굽다리를 세웠다. 옆면은 한 모서리에 주둥이를 붙이고, 각 면에는 청화와 철화기법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칠언절구를 써 넣었다. 이 시는 李瑞雨(1633~1709)의 [河濱遺法歷周秦]을 고쳐 쓰면서 연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河濱遺質歷周秦 - 하빈에 남겨 놓은 질로 주진시대를 거쳐 呑吐淸波兩穴回 - 푸른 파도를 삼키고 토해 내며 양 구멍을 떠도네. 形靜玉山心藥水 - 형태는 옥으로 만든 산과 같고 마음은 심신을 치료하는 약수로세. 孰如其智孰如仁 - 남의 모자람을 미워하는 지혜가 나은가 가엾게 여기는 어짊이 나은가.


호랑이 까치무늬 항아리(白磁 靑畵 虎鵲文 壺), 조선18~19세기, 높이44.1cm, 오사카시립도자미술관 소장











黃花叫賣遍街聲 - 국화꽃 파는 소리 온 거리 가득한데 樣樣年增譜外名 - 해마다 다른 모습[국보菊譜]밖의 이름일세 是菊皆陶籬下物 - 국화 모두 도연명의 울타리 밑 물건인데 就中何獨喚淵明 - 개중에 어이 홀로 연명이라 불리는가? 翠像朱欄鬪品形 - 푸른 화분 붉은 난간 품형品形을 다투거니 不堪紅紫濫芳馨 - 붉은빛 자주빛 짙은 향기 대단해라 竟知純潔偏多忌 - 순결함이 꺼림 받음 마침내 알겠구나 天亦慳成白鶴翎 - 하늘 또한 백학령白鶴翎을 간신히 만들었네 신위(申緯,1769~1845), [詠菊六絶句]중에서 [정민 교수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책속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2,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전-3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과 글, 권진순 조선 청화 도록을 참조하였습니다 2014년 10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