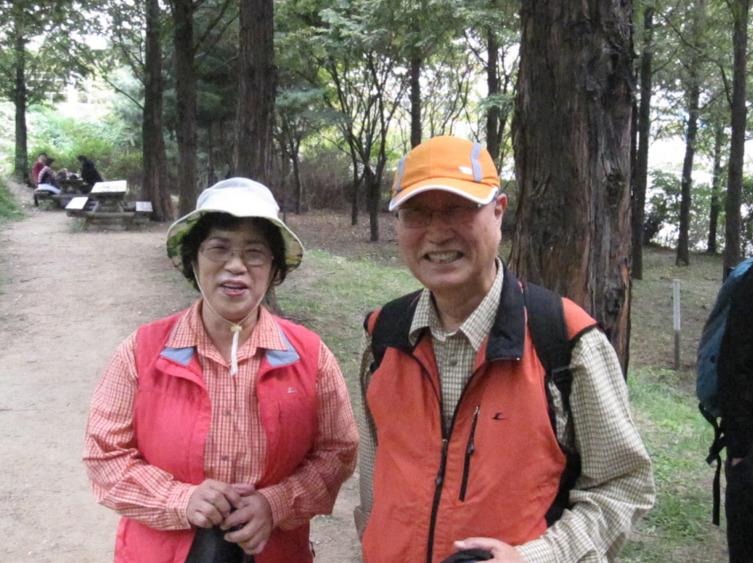우리궁궐지킴이
보광사, 용미리 마애석불, 화석정, 반구대를 찾아서 본문
11월 3일 중근세관 파주 사전 답사 준비
(보광사, 용미리 마애석불, 화석정, 반구대를 찾아서)
1. 파주 광탄 보광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474번길 85,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를 찾아가다. '동국여지승람' 과 退耕 權相老선생이 수집해 놓은 "寺刹全書" 보광사조에는 고종 광무 5년(1901) 朗應 鏡臨이 지은 '고령산 보광사 법전 중창 병단호기서(古靈山普光寺法殿重創幷丹雘記序)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 겨우 절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다. 영조대왕의 어머니이신 淑嬪최씨의 묘소가 가까이 昭寧園의 願刹이기도 한 천년고찰인 普光寺는 신라 진성여왕 8년(894) 道詵국사가 初創하고 고려 고종2년(1215) 圓眞국사가 重創, 우왕 14년(1388) 無學대사가 三創, 현종 8년(1667) 智侃, 釋蓮 양 선사가 四創, 영조 16년(1740) 重修, 고종 광무 5년(1901)의 중수가 있었다고 하였다. 고령산보광사 일주문(古靈山普光寺一柱門)이 곳 고령산에는 보광사, 납골당인 영각전(靈覺殿), 무량수전 아미타불을 모신 수구암(守口庵), 관음기도 정진도량인 영묘암(靈妙庵), 정상 부근의 도솔암(兜率庵) 등을 포용하고 있다. 옛 신령스런 산(고령산)에 육계의 정토(도솔)꽃 내려 와 피니 넓은 빛(보광)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성파 대종사 범어중에서-
고령산보광사 일주문(古靈山普光寺一柱門)이 곳 고령산에는 보광사, 납골당인 영각전(靈覺殿), 무량수전 아미타불을 모신 수구암(守口庵), 관음기도 정진도량인 영묘암(靈妙庵), 정상 부근의 도솔암(兜率庵) 등을 포용하고 있다. 옛 신령스런 산(고령산)에 육계의 정토(도솔)꽃 내려 와 피니 넓은 빛(보광)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성파 대종사 범어중에서-
 고령산보광사 현판 구양순체 글씨로 영조대왕의 어필(御筆)이라 전한다
고령산보광사 현판 구양순체 글씨로 영조대왕의 어필(御筆)이라 전한다 만세루(萬歲樓) 講堂, 강당의 현판 만세루 글씨는 활달하다, 조선 말 고종 연간의 글씨로 보고 있다
만세루(萬歲樓) 講堂, 강당의 현판 만세루 글씨는 활달하다, 조선 말 고종 연간의 글씨로 보고 있다 대웅보전(大雄寶殿) 갑자중추옥간서(甲子仲秋 玉澗書)라는 관서(款書)가 붙어 있다. 옥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한석봉체 계통으로 결구도 좋고 필력도 있으며 서법도 단아하여 손색없는 명필이다. 영조의 친필로 전해 지기도 한다. 만약 영조의 친필이면 갑자년이 영조 20년(1744)이 된다.
대웅보전(大雄寶殿) 갑자중추옥간서(甲子仲秋 玉澗書)라는 관서(款書)가 붙어 있다. 옥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한석봉체 계통으로 결구도 좋고 필력도 있으며 서법도 단아하여 손색없는 명필이다. 영조의 친필로 전해 지기도 한다. 만약 영조의 친필이면 갑자년이 영조 20년(1744)이 된다. 대웅보전5존불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다폿집, 주존 석가모니불과 동방(좌) 약사불, 서방(우) 아미타불을 모셨고 그 옆에 자씨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 양대 보살을 협시하였다. 주존이신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 106cm,어깨높이 68cm이며, 고려 고종2년(1215) 원진국사가 중창할 당시 法敏대사가 木造佛菩薩像 5위를 봉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부처님 오신날 보광사 법요식에서)
대웅보전5존불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다폿집, 주존 석가모니불과 동방(좌) 약사불, 서방(우) 아미타불을 모셨고 그 옆에 자씨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 양대 보살을 협시하였다. 주존이신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 106cm,어깨높이 68cm이며, 고려 고종2년(1215) 원진국사가 중창할 당시 法敏대사가 木造佛菩薩像 5위를 봉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부처님 오신날 보광사 법요식에서) 대웅보전 외부 판벽화 대체로 전각의 벽체는 흙이나 회를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벽체는 모두 판자를 끼운 판벽이다. 판벽은 회벽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져 그곳에 그려진 벽화들의 수명이 짧다. 남측 면에 불교의 호법선신인 위태천을 그린 '韋駄天圖'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의 모습을 묘사한 '騎獅文殊童子圖(기사문수동자도)'이며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金剛力士圖(금강역사도)' 등 3점이 그려져 있다.
대웅보전 외부 판벽화 대체로 전각의 벽체는 흙이나 회를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벽체는 모두 판자를 끼운 판벽이다. 판벽은 회벽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져 그곳에 그려진 벽화들의 수명이 짧다. 남측 면에 불교의 호법선신인 위태천을 그린 '韋駄天圖'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의 모습을 묘사한 '騎獅文殊童子圖(기사문수동자도)'이며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金剛力士圖(금강역사도)' 등 3점이 그려져 있다. 동측 면에'龍船人接圖, '老松圖','大虎圖' 그리고 '怪石圖','蓮華化生圖' 등 5점이 그려져 있다.
동측 면에'龍船人接圖, '老松圖','大虎圖' 그리고 '怪石圖','蓮華化生圖' 등 5점이 그려져 있다. 북측 면에 선재동자와 함께 그려진 '백의관음도' 6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동자를 표현한 '騎象童子圖' 등 2점이 그려져 있으며 남.동.북면에 모두 10점이 남아 있다
북측 면에 선재동자와 함께 그려진 '백의관음도' 6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동자를 표현한 '騎象童子圖' 등 2점이 그려져 있으며 남.동.북면에 모두 10점이 남아 있다
 원통전, 혹은 관음전,보타전이라 부르며 관세음보살을 모셨다
원통전, 혹은 관음전,보타전이라 부르며 관세음보살을 모셨다
 지장전, 혹은 명부전,시왕전이라 부르며 지장보살을 모셨다
지장전, 혹은 명부전,시왕전이라 부르며 지장보살을 모셨다 어실각(御室閣) 영조대왕의 사모곡이 스며있는 곳, 어머니 숙빈최씨의 위패를 모신 곳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궁의 무수리로 출발하여 그 왕후가 폐출되었을 때 지극 정성으로 복위를 기원한 공덕으로 숙종을 감동시켜 자신은 후궁이 되고 인현왕후는 복위되는 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어실각(御室閣) 영조대왕의 사모곡이 스며있는 곳, 어머니 숙빈최씨의 위패를 모신 곳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궁의 무수리로 출발하여 그 왕후가 폐출되었을 때 지극 정성으로 복위를 기원한 공덕으로 숙종을 감동시켜 자신은 후궁이 되고 인현왕후는 복위되는 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숙빈 최씨의 신위 和敬徽德安順綏福淑嬪海州崔氏之神 位(화경휘덕안순수복숙빈해주최씨지신 위)
숙빈 최씨의 신위 和敬徽德安順綏福淑嬪海州崔氏之神 位(화경휘덕안순수복숙빈해주최씨지신 위) 영조대왕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 300년된 향나무
영조대왕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 300년된 향나무


 응진전, 혹은 나한전
응진전, 혹은 나한전 이희성 육군대장의 발원으로 1981년에 조성하였다는 보광사 호국대불 높이가 41척(약12,3m)의 거대한 규모의 백화강암제(白花崗岩製)이다
이희성 육군대장의 발원으로 1981년에 조성하였다는 보광사 호국대불 높이가 41척(약12,3m)의 거대한 규모의 백화강암제(白花崗岩製)이다

 普光寺護國大佛造成緣起碑(보광사호국대불조성연기비) -비석 앞면 비문 전문- 불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 호국불교로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이 민족과 함께 울고 웃으며 조국의 장래를 같이 해온 한맺힌 절규가 여기에 있다. 전란시에 치열한 격전지로 피밭골과 됫박고개라 이름하여진 곳 분단된 조국의 허리 우리의 요새, 북쪽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수도 서울이 자리한 경기 양주 백석의 고령산 보광사지가 이곳이다. 이 사찰은 신라51대 진성여왕8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이래 고려 고종2년에 원진국사가 재창하고 우왕14년에 무학대사가 삼창하였으나 선조25년 임진난으로 인한 국운의 풍전등화가 이를 전소시켜 다시 현종7년 지간,석연대사가 사창하였으며 영조원년에 오창되었다. 이 지역은 임란시 서산,사명대사의 휘하 승의병 양민 모두가 왜적과의 혈전지로 그 때 장렬히 전사한 이름없는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위령탑 하나 없이 이 민족의 한을 깊이 묻어버린 애국열사들의 구국이념을 오늘에야 들추어내게됨은 근일 이곳에서 진신사리의 출현이다. 사리출현은 우리의 불자들의 가슴깊이에 호국불교의 전통을 일깨우는 자비하신 부처님의 뜻을 再啓하는 求法시대의 實證法文임과 동시에 호국이념과 불교사상을 구현하는 佛恩임을 감지케하고 국난극복과 통일염원을 부처님의 가호아래 三寶가 부르는 소리를 인연하여 이희성육군대장 발원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갑진거사를 위원장으로 불사를 진행하여 조국의 허리 분단된 요새위에 그 신앙을 깊이 심어 올리는 불상 높이 41척의 大作佛事를 감행하므로써 애국열사들의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국태민안과 평화적 남북통일의 성취를 기원하는 민족의 한스런 갈구를 기록하노라.
普光寺護國大佛造成緣起碑(보광사호국대불조성연기비) -비석 앞면 비문 전문- 불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 호국불교로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이 민족과 함께 울고 웃으며 조국의 장래를 같이 해온 한맺힌 절규가 여기에 있다. 전란시에 치열한 격전지로 피밭골과 됫박고개라 이름하여진 곳 분단된 조국의 허리 우리의 요새, 북쪽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수도 서울이 자리한 경기 양주 백석의 고령산 보광사지가 이곳이다. 이 사찰은 신라51대 진성여왕8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이래 고려 고종2년에 원진국사가 재창하고 우왕14년에 무학대사가 삼창하였으나 선조25년 임진난으로 인한 국운의 풍전등화가 이를 전소시켜 다시 현종7년 지간,석연대사가 사창하였으며 영조원년에 오창되었다. 이 지역은 임란시 서산,사명대사의 휘하 승의병 양민 모두가 왜적과의 혈전지로 그 때 장렬히 전사한 이름없는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위령탑 하나 없이 이 민족의 한을 깊이 묻어버린 애국열사들의 구국이념을 오늘에야 들추어내게됨은 근일 이곳에서 진신사리의 출현이다. 사리출현은 우리의 불자들의 가슴깊이에 호국불교의 전통을 일깨우는 자비하신 부처님의 뜻을 再啓하는 求法시대의 實證法文임과 동시에 호국이념과 불교사상을 구현하는 佛恩임을 감지케하고 국난극복과 통일염원을 부처님의 가호아래 三寶가 부르는 소리를 인연하여 이희성육군대장 발원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갑진거사를 위원장으로 불사를 진행하여 조국의 허리 분단된 요새위에 그 신앙을 깊이 심어 올리는 불상 높이 41척의 大作佛事를 감행하므로써 애국열사들의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국태민안과 평화적 남북통일의 성취를 기원하는 민족의 한스런 갈구를 기록하노라. 수구암의 무량수전(守口庵의 無量壽殿) 이 수구암오르는 길은 숲길이 울창하여 별세계에 들어오는 느낌이었고 암자에 들어서니 앞이 탁 트여 호연지기를 느낄 만하다. 이곳이야말로 공부터로 최상의 길지이다. 이름도 입 다물고 공부하라는 守口庵이다.
수구암의 무량수전(守口庵의 無量壽殿) 이 수구암오르는 길은 숲길이 울창하여 별세계에 들어오는 느낌이었고 암자에 들어서니 앞이 탁 트여 호연지기를 느낄 만하다. 이곳이야말로 공부터로 최상의 길지이다. 이름도 입 다물고 공부하라는 守口庵이다.

 무량수전 우물천정과 용 두마리 그리고 연등
무량수전 우물천정과 용 두마리 그리고 연등 수구암 편액
수구암 편액

 삼성각의 불화 가운데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北極星)와 七星,좌측에 호랑이와 山神, 우측에 나반존자(那畔尊子), 獨聖 "오늘"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나서 부터가 아니라 오늘서 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 오신날 보광사 법요식에서) 글은 최완수 저 명찰순례 2권 보광사와 조계종 보광사 홈피를 참조하였습니다.2. 파주 용미리 마애불 석불입상
삼성각의 불화 가운데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北極星)와 七星,좌측에 호랑이와 山神, 우측에 나반존자(那畔尊子), 獨聖 "오늘"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나서 부터가 아니라 오늘서 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 오신날 보광사 법요식에서) 글은 최완수 저 명찰순례 2권 보광사와 조계종 보광사 홈피를 참조하였습니다.2. 파주 용미리 마애불 석불입상 경기 파주 용미리 마애불 석불입상2구(보물 93 호): 고려초기 (10 세기)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용암사 경내) 이곳 용미리(龍尾里) 라는 지명은 광주산맥을 타고 들어온 용들이 한양에 머물렀는데그 꼬리가 이곳에 닿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 용미리에 마애불이 새겨진 이유는 북에서 육로로 왔던 중국의 사신들이 묵던 숙소가 있던 벽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벽제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10 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곳에 중국 사신들의 숙소가 있었다.(물론 지금은 화장터로 더 유명해져 버렸지만) 벽제에서 묵었던 중국 사신들이 다시 북으로 올라갈 때 이곳의 육로를 이용하였으므로 그들의 안전한 귀국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곳 용미리에 마애불을 세웠다고 한다. - 이 2불상은 거대한 바위를 다듬어 몸체로 하고 그 위에 머리를 따로 만들어 얹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을 취한 마애불로는 경북 안동 이천동 석불입상 (보물115 호), 충남 논산 상도리 마애불, 경북 봉화 봉성리 마애불 등이 있다. 게다가 고려 초기에는 불상이 거대화되고 지역별로 토속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용미리 마애불이다. - 나란히 서 있는 2 개의 불상중에서 둥근 갓을 쓴,오른쪽 불상은 남자상 (미륵불)으로서 양 손에는 무언가 (연꽃 등) 를 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네모난 모자를 쓴 왼쪽 불상은 여자상(미륵보살)으로서 두 손을 합장하고 있다.
경기 파주 용미리 마애불 석불입상2구(보물 93 호): 고려초기 (10 세기)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용암사 경내) 이곳 용미리(龍尾里) 라는 지명은 광주산맥을 타고 들어온 용들이 한양에 머물렀는데그 꼬리가 이곳에 닿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 용미리에 마애불이 새겨진 이유는 북에서 육로로 왔던 중국의 사신들이 묵던 숙소가 있던 벽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벽제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10 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곳에 중국 사신들의 숙소가 있었다.(물론 지금은 화장터로 더 유명해져 버렸지만) 벽제에서 묵었던 중국 사신들이 다시 북으로 올라갈 때 이곳의 육로를 이용하였으므로 그들의 안전한 귀국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곳 용미리에 마애불을 세웠다고 한다. - 이 2불상은 거대한 바위를 다듬어 몸체로 하고 그 위에 머리를 따로 만들어 얹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을 취한 마애불로는 경북 안동 이천동 석불입상 (보물115 호), 충남 논산 상도리 마애불, 경북 봉화 봉성리 마애불 등이 있다. 게다가 고려 초기에는 불상이 거대화되고 지역별로 토속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용미리 마애불이다. - 나란히 서 있는 2 개의 불상중에서 둥근 갓을 쓴,오른쪽 불상은 남자상 (미륵불)으로서 양 손에는 무언가 (연꽃 등) 를 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네모난 모자를 쓴 왼쪽 불상은 여자상(미륵보살)으로서 두 손을 합장하고 있다. 龍尾里 마애불 석불입상의 뒷모습
龍尾里 마애불 석불입상의 뒷모습 이곳은 고려 초기 선종의 후궁인 원신궁주(元信宮主)가 아들 <한산후> 를 낳기 위해 지금의 용암사 자리에 이 마애불을 만들어 놓고 공양하고 기도한 곳이라는데 이러한 사실이 마애불이 새겨진 바위 앞 왼쪽(정면에서 보아 오른쪽) 아래부분에 새겨져 있어 그 역사적 진실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곳은 고려 초기 선종의 후궁인 원신궁주(元信宮主)가 아들 <한산후> 를 낳기 위해 지금의 용암사 자리에 이 마애불을 만들어 놓고 공양하고 기도한 곳이라는데 이러한 사실이 마애불이 새겨진 바위 앞 왼쪽(정면에서 보아 오른쪽) 아래부분에 새겨져 있어 그 역사적 진실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3. 파주 화석정
3. 파주 화석정


花石亭詩(화석정시) -八歲賦詩(팔세부시)- 林亭秋已晩(임정추이만) -숲속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어드니, 騷客意無窮(소객의무궁) -시인의 시상이 끝이 없구나, 遠水連天碧(원수연천벽) -멀리 보이는 물은 하늘에 잇닿아 푸르고, 霜楓向日紅(상풍향일홍) -서리맞은 단풍은 햇볕을 향해 붉구나. 山吐孤輪月(산토고윤월) -산위에는 둥근 달이 떠오르고, 江含萬里風(강함만리풍) -강은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었네. 塞鴻何處去(색홍하처거) -변방의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날아가는고? 聲斷暮雲中(성단모운중) -울고 가는 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 이 이 지음 이동석 옮김율곡 이이 선생은(1536 : 중종31~1584년 : 선조17) 조선중기 대표적 성리 학자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등 전분야에 걸쳐 계혁정책을 실현한 경세가였습니다. 화석정시는 율곡선생이 8세 때 지은 시로, 화석정의 가을 정취와 선생의 시상을 조화롭게 엮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화석정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 시를 통해 이 곳의 역사적 유래와 율곡선생의 생애를 되새겨 보게 하고자 이 비를 건립합니다. 2001. 12. 파주시장 송 달 용임진강을 바라보며 옛날 선조가 황급히 의주로 몽진 할 때 비 쏟아지는 칠흙같은 임진강에서 배를 건너기 위하여 불을 밝히기 위하여 정자에 불을 질렀다는 고사를 회상하며 유비무환,사회안정,국론통일,경제성장 이율곡의 십만양병설등 안보가 그 으뜸이다 국운이 날로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빌면서...4. 파주 반구정
 황희 정승의 일화 1) 단벌 정승 황희(A prime minister in his only suit) 갈아 입을 관복이 없어 바지 속통만 입고 입궐한 황희 진눈깨비가 내린 어느 겨울날, 퇴궐한 영의정 황희가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서둘러 옷을 뜯어서 빨아주시오. 밤새 말리고 꿰매면 내일 아침 입궐할 때 입을 수 있을 것이오." 영의정 황희는 겨울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 그래서 빨랫감을 부인에게 내어주고 속옷차림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대감마님, 속히 입궐하라는 어명이십니다." 부인은 당황해 하며 말했다. "에구머니,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어서 입궐하셔야 하는데 무얼 입고 들어가신단 말입니까?" 황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하는 수 없소. 그 솜이라도 가져오시오." "솜이라니요?" "바지저고리를 뜯어 빨았으면 솜이라도 있지 않겠소?" "대감도 참 딱하십니다. 어떻게 솜만 꿰매 입고서 입궐하시겠단 말씀입니까?" "그럼 어쩌겠소? 어명이니 입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벌거벗은 채 관복만 걸칠 수는 없는 일이니, 어서 솜을 가져오시오." 황희는 부인이 가져온 솜을 몸에 둘렀다. "부인, 굵은 실로 좀......." 부인이 바지 솜과 저고리 솜을 실로 얼기설기 이어 주자, 황희는 그 위에 관복을 덧입고 서둘러 입궐했다. 대궐에 들어셨을 때는 이미 세종이 여러 신하들과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칠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종의 눈에 황희의 관복 밑으로 비죽이 나온 하얀 것이 얼핏 보였다. 세종은 그게 양털인 줄 알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것 참 이상하도다. 청렴하고 검소하기로 소문난 황 정승이 양털로 옷을 해 입다니...' 회의가 끝나고 세종은 황희를 가까이 오라고 일렀다. "과인이 듣기로 경의 청렴결백이야말로 모든 이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 오늘은 양털 옷을 입으시었소?" 황희는 당황하여 가까스로 대답했다.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실은 저어...... 이것은 양털이 아니오라 솜이옵니다." "솜? 솜이라니? 왜 솜을 걸치고 다니시오?" "예, 전하, 신은 겨울옷이 한 벌뿐이라......, 오늘은 마침 일찍 퇴궐했기에 그 옷을 뜯어서......." "이리 좀 더 다가오시오, 이럴 수가!" 세종은 황희의 옷 밑으로 삐져나온 솜을 만져보았다. "아무리 청빈한 생활을 한다 해도 어찌 단벌로 겨울을 날 수 있겠소. 여봐라!" "예" "황 대감에게 당장 비단 열필을 내리도록 하라!" 황희는 정색을 하며 아뢰었다.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방금 내리신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백성은 계속된 흉년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많사옵니다. 이런 때 어찌 영상인 신의 몸에 비단을 걸치겠습니까? 솜옷 한 벌로도 과분하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오! 과연 경다운 말이오. 과인이 용포를 걸치고 있음이 부끄럽소이다." 결국 세종은 비단을 하사하라는 명을 거두었다고 한다.2) 김종서 길들이기 어느 날 회의 때 김종서가 술에 취해 비스듬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황희는 하급 관원에게 일렀다. "지금 병판의 앉은 자세가 바르지 않으니, 의자 다리가 잘못된 모양이다. 어서 고치도록 하라!" 그말을 들은 김종서는 머리끝이 저절로 쭈뼛해짐을 느끼고 자세를 바로 고쳤다. 회의가 끝난 후 황희가 자리를 뜨자.김종서는 검연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6진을 개척할 당시 밤중에 적의 화살이 날아들어 책상머리에 꽂혔어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식은땀이 등을 적시었소이다." 김종서가 강원도 지방을 순찰하고 돌아 올 때 토종 꿀 한 단지를 병졸을 시켜 황희에게 보냈다. "이 꿀은 뇌물로 받았거나 공짜로 받은 것이 분명하다.또 나라의 녹봉을 받는 공인을 사적인 심부름꾼으로 부리다니!" 황희는 호통을 치며 꿀을 돌려보냈다. 어느날 좌의정 맹사성이 황희에게 물었다. "김종서는 당대의 이름난 재상이고, 공이 추천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구박이 그리 심하시오?" 황희는 앉아 있던 의자를 툭툭 치면서 대답했다. "김종서는 이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이오. 김종서는 성품이 거만하고 대사를 도모하는 데 너무 과격하여 앞으로 자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볼 때가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그 자만심을 꺾고 모든 일에 경솔하지 말라는 것이지 결코 그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오."두문불출의 유래(杜門不出의 由來) 고려가 망하자 그때까지 섬겨온 왕을 배반하고 새로운 왕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고려의 신하 72명이 벼슬을 버리고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기슭에 있는 두문동에 들어가, 모든 길을 막아 빗장을 걸어 놓고(杜門)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不出)에서 유래됐다 새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유능한 신하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설득했으나 허사였다. 그들 七十二賢은 산골마을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한다. 두문동에 함께 들어간 황희도 처음에는 태조의 부름에 거절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어도 백성은 바뀌지 않았으니 백성을 위해 일할 젊은 인재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두문동 선비들의 권유와 설득으로 산에서 내려오게 됐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때 황희의 나이 30세였다. 조선 건국초기에는 두문동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다가, 정조 7년 개성의 성균관에 표절사를 세워 고려의 충신인 두문동 72현의 제사를 모시게 했다.朝鮮時代 最長壽 淸白吏 政丞, 黃喜 1363년(공민왕 12)~1452년(문종 2)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長水, 초명은 壽老, 자는 懼夫, 호는 厖村, 石富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均庇이고, 아버지는 資憲大夫判江陵大都護府使 君瑞이며, 어머니는 金祐의 딸이다. 개성 可助里에서 출생했다. 1376년(우왕 2) 복안궁 녹사가 되었다. 1383년에는 사마시, 1385년 진사시에 각각 합격하였고 1389년에는 문과에 급제한 뒤, 1390년(공양왕 2) 성균관 학록이 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杜門洞에서 은거하다가 1394년(태조 3) 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동료들의 천거로 성균관 학관이 되었으며 세자의 스승인 世子右正字를 겸임하였다. 이후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쳐, 6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태종의 신뢰를 받았으나 1418년 세자(讓寧大君) 폐출의 불가함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사서 폐서인되어 交河와 전라도 南原에 5년간 유배되었다가, 태종의 건의로 세종에 의해 다시 복직되었다. 이후 굶주림이 장기화된 강원도에 관찰사로 나가 백성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민심을 얻었으며 동시에 세종의 신뢰 또한 얻게 된다. 이후 이조판서와 우의정,좌의정 겸 世子師(세자의 스승) 등을 지냈으며, 1431년(세종 13)에 69세의 나이로 영의정이 되었다. 이후 18년 동안 세종을 잘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끌다가 87세에 관직에서 물러났다. 은퇴한 뒤에도 국가 중대사의 경우 세종의 자문에 응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파주 문산 반구정에서 갈매기와 같이 여생을 보내다가 향년 90세에 서거했다. 파주 탄현 금승리에 안장되었다.
황희 정승의 일화 1) 단벌 정승 황희(A prime minister in his only suit) 갈아 입을 관복이 없어 바지 속통만 입고 입궐한 황희 진눈깨비가 내린 어느 겨울날, 퇴궐한 영의정 황희가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서둘러 옷을 뜯어서 빨아주시오. 밤새 말리고 꿰매면 내일 아침 입궐할 때 입을 수 있을 것이오." 영의정 황희는 겨울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 그래서 빨랫감을 부인에게 내어주고 속옷차림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대감마님, 속히 입궐하라는 어명이십니다." 부인은 당황해 하며 말했다. "에구머니,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어서 입궐하셔야 하는데 무얼 입고 들어가신단 말입니까?" 황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하는 수 없소. 그 솜이라도 가져오시오." "솜이라니요?" "바지저고리를 뜯어 빨았으면 솜이라도 있지 않겠소?" "대감도 참 딱하십니다. 어떻게 솜만 꿰매 입고서 입궐하시겠단 말씀입니까?" "그럼 어쩌겠소? 어명이니 입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벌거벗은 채 관복만 걸칠 수는 없는 일이니, 어서 솜을 가져오시오." 황희는 부인이 가져온 솜을 몸에 둘렀다. "부인, 굵은 실로 좀......." 부인이 바지 솜과 저고리 솜을 실로 얼기설기 이어 주자, 황희는 그 위에 관복을 덧입고 서둘러 입궐했다. 대궐에 들어셨을 때는 이미 세종이 여러 신하들과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칠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종의 눈에 황희의 관복 밑으로 비죽이 나온 하얀 것이 얼핏 보였다. 세종은 그게 양털인 줄 알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것 참 이상하도다. 청렴하고 검소하기로 소문난 황 정승이 양털로 옷을 해 입다니...' 회의가 끝나고 세종은 황희를 가까이 오라고 일렀다. "과인이 듣기로 경의 청렴결백이야말로 모든 이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 오늘은 양털 옷을 입으시었소?" 황희는 당황하여 가까스로 대답했다.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실은 저어...... 이것은 양털이 아니오라 솜이옵니다." "솜? 솜이라니? 왜 솜을 걸치고 다니시오?" "예, 전하, 신은 겨울옷이 한 벌뿐이라......, 오늘은 마침 일찍 퇴궐했기에 그 옷을 뜯어서......." "이리 좀 더 다가오시오, 이럴 수가!" 세종은 황희의 옷 밑으로 삐져나온 솜을 만져보았다. "아무리 청빈한 생활을 한다 해도 어찌 단벌로 겨울을 날 수 있겠소. 여봐라!" "예" "황 대감에게 당장 비단 열필을 내리도록 하라!" 황희는 정색을 하며 아뢰었다.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방금 내리신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백성은 계속된 흉년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많사옵니다. 이런 때 어찌 영상인 신의 몸에 비단을 걸치겠습니까? 솜옷 한 벌로도 과분하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오! 과연 경다운 말이오. 과인이 용포를 걸치고 있음이 부끄럽소이다." 결국 세종은 비단을 하사하라는 명을 거두었다고 한다.2) 김종서 길들이기 어느 날 회의 때 김종서가 술에 취해 비스듬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황희는 하급 관원에게 일렀다. "지금 병판의 앉은 자세가 바르지 않으니, 의자 다리가 잘못된 모양이다. 어서 고치도록 하라!" 그말을 들은 김종서는 머리끝이 저절로 쭈뼛해짐을 느끼고 자세를 바로 고쳤다. 회의가 끝난 후 황희가 자리를 뜨자.김종서는 검연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6진을 개척할 당시 밤중에 적의 화살이 날아들어 책상머리에 꽂혔어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식은땀이 등을 적시었소이다." 김종서가 강원도 지방을 순찰하고 돌아 올 때 토종 꿀 한 단지를 병졸을 시켜 황희에게 보냈다. "이 꿀은 뇌물로 받았거나 공짜로 받은 것이 분명하다.또 나라의 녹봉을 받는 공인을 사적인 심부름꾼으로 부리다니!" 황희는 호통을 치며 꿀을 돌려보냈다. 어느날 좌의정 맹사성이 황희에게 물었다. "김종서는 당대의 이름난 재상이고, 공이 추천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구박이 그리 심하시오?" 황희는 앉아 있던 의자를 툭툭 치면서 대답했다. "김종서는 이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이오. 김종서는 성품이 거만하고 대사를 도모하는 데 너무 과격하여 앞으로 자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볼 때가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그 자만심을 꺾고 모든 일에 경솔하지 말라는 것이지 결코 그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오."두문불출의 유래(杜門不出의 由來) 고려가 망하자 그때까지 섬겨온 왕을 배반하고 새로운 왕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고려의 신하 72명이 벼슬을 버리고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기슭에 있는 두문동에 들어가, 모든 길을 막아 빗장을 걸어 놓고(杜門)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不出)에서 유래됐다 새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유능한 신하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설득했으나 허사였다. 그들 七十二賢은 산골마을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한다. 두문동에 함께 들어간 황희도 처음에는 태조의 부름에 거절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어도 백성은 바뀌지 않았으니 백성을 위해 일할 젊은 인재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두문동 선비들의 권유와 설득으로 산에서 내려오게 됐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때 황희의 나이 30세였다. 조선 건국초기에는 두문동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다가, 정조 7년 개성의 성균관에 표절사를 세워 고려의 충신인 두문동 72현의 제사를 모시게 했다.朝鮮時代 最長壽 淸白吏 政丞, 黃喜 1363년(공민왕 12)~1452년(문종 2)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長水, 초명은 壽老, 자는 懼夫, 호는 厖村, 石富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均庇이고, 아버지는 資憲大夫判江陵大都護府使 君瑞이며, 어머니는 金祐의 딸이다. 개성 可助里에서 출생했다. 1376년(우왕 2) 복안궁 녹사가 되었다. 1383년에는 사마시, 1385년 진사시에 각각 합격하였고 1389년에는 문과에 급제한 뒤, 1390년(공양왕 2) 성균관 학록이 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杜門洞에서 은거하다가 1394년(태조 3) 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동료들의 천거로 성균관 학관이 되었으며 세자의 스승인 世子右正字를 겸임하였다. 이후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쳐, 6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태종의 신뢰를 받았으나 1418년 세자(讓寧大君) 폐출의 불가함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사서 폐서인되어 交河와 전라도 南原에 5년간 유배되었다가, 태종의 건의로 세종에 의해 다시 복직되었다. 이후 굶주림이 장기화된 강원도에 관찰사로 나가 백성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민심을 얻었으며 동시에 세종의 신뢰 또한 얻게 된다. 이후 이조판서와 우의정,좌의정 겸 世子師(세자의 스승) 등을 지냈으며, 1431년(세종 13)에 69세의 나이로 영의정이 되었다. 이후 18년 동안 세종을 잘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끌다가 87세에 관직에서 물러났다. 은퇴한 뒤에도 국가 중대사의 경우 세종의 자문에 응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파주 문산 반구정에서 갈매기와 같이 여생을 보내다가 향년 90세에 서거했다. 파주 탄현 금승리에 안장되었다. 방촌유훈(厖村遺訓) 虛文之事 一切勿行(헛된 문장의 일은 일체 행하지 마라) 23세손 黃圭卨(황규설)이 쓰다
방촌유훈(厖村遺訓) 虛文之事 一切勿行(헛된 문장의 일은 일체 행하지 마라) 23세손 黃圭卨(황규설)이 쓰다
 반구정기는 조선중기의 문신이요, 학자인 미수(眉叟) 허목(許穆) 선생의 글로 반구정을 찾은 감회와 방촌 선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구정기는 조선중기의 문신이요, 학자인 미수(眉叟) 허목(許穆) 선생의 글로 반구정을 찾은 감회와 방촌 선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伴鷗亭重修記 坡州舊治之西十五里許臨津江下有里焉曰沙鶩也 峰回路轉有亭翼然臨于江渚者伴鷗亭也 翼成黃公厖村先生退休之所也 盖公識度深遠局量宏邃始終一誠自家 而國至於臨大事決大義垂紳正笏不動聲色 而措國家於泰山之安至談李朝賢相者未嘗不以公爲先焉 聖世賢相昇平之時國有蓍龜民有父母學者有師斯文 有傳鄕有善俗世有良村其功施之普化行之美盖不可數計 而周知公之去也幼子無所仰庇朝廷無所稽疑斯文化爲異端 君子無與爲善小人沛然自得嗟夫公之存亡關於一世之治亂矣 昔公請老而歸于此以爲讀書養德之所而杖屨攸曁江草含香山 木生光斯亭屢廢屢興先有許公眉叟之記後有尹喜求先生之記 俱可誦而今不可見今其後孫會誠合力重建遺址高亭像舊制 而新之於是乎潛德發而幽光闡士林相慶曰先生遺躅斯可以復見矣 斯道益明則斯亭之棟樑階砌當與山水俱長也 一九六七年 六月 日 坡州郡守 南相集 謹記한자 鶩 : 집오리 목, 邃 : 깊을 수, 厖 : 클 방, 蓍龜(시귀 : 점을 치는 복서), 杖屨攸曁(장구유기 : 지팡이,신발, 바, 및), 階砌(계체 : 계단과 섬돌) 반구정 중수기(번역문) 옛날 파주군 서쪽 십오리 쯤되는 임진강 하류에 있는 마을은 사목리이고 길을 빙 둘러 들어가면 우뚝 솟은 봉우리 위에 새로 지은 정자가 강을 내려다 보게 된 것은 반구정인데 여기는 바로 翼成黃公 방촌선생께서 退遊하던 곳이었다. 대개 공은 깊은 식견과 탁월한 器局으로 국가에 대해 始終이 한결같았다. 대사를 결정하고 대의를 판단할 때 띠를 드리우고 笏을 바로 잡은 후, 聲音과 辭色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도 온 국가를 태산과 반석처럼 굳게 다져 놓았었다.이러므로 지금까지 조선의 현상을 따질 때면 반드시 공을 우두 머리로 삼는다. 착한 임금과 어진 재상이 태평시대를 이룩하게 되자, 국가에는 시귀(蓍龜)처럼 여기고 백성은 부모처럼 여겼다. 학자는 스승이 있게 되고 斯文은 전통이 있게 되었으며 시골에는 아름다운 풍속이 행해지고 세상에는 어진 인재가 다 뽑히게 되어 널리 베풀어진 정치와 교화가 한없이 훌륭했는데 낱낱이 다 열거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이 돌아간 후에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는 이가 없고 조정에도 의심스러운 일을 물을 데가 없었다. 사문이 異端으로 변하여 군자는 손잡을 사람이 없고 소인들만 제대로 시대를 잘 만난듯이 여겼다. 아! 이로 본다면 공의 존망은 한 시대 治亂에 관계가 컸었다. 옛날 공이 벼슬을 그만두고 이곳에 돌라와 반구정을 이룩하여 독서하고 養德하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장구(杖屨)가 미친 바에는 강풀과 산숲도 모두 향기롭게 빛났었다. 이 정자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은 許公 眉叟(미수)의 기문과 尹喜求선생의 후기가 모두 외울만 한데 지금은 정자가 없어졌다. 그래서 모든 후손이 성력을 모아 옛 터에다 정자를 다시 지었는데 옛날 제도에 따라 더 일신하게 하였다. 선생의 숨겨진 덕과 깊은 경지가 다시 나타나자 士林들이 서로 경사로 여기면서 "선생의 유족을 여기에서 다시 볼 수 있겠다. 이 올바른 도가 더욱 밝혀진다면 이 정자의 동량과 계체(階砌)도 마땅히 저 산수와 함께 길이 보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967년 6월 일 파주군수 남상집 삼가 지음
伴鷗亭重修記 坡州舊治之西十五里許臨津江下有里焉曰沙鶩也 峰回路轉有亭翼然臨于江渚者伴鷗亭也 翼成黃公厖村先生退休之所也 盖公識度深遠局量宏邃始終一誠自家 而國至於臨大事決大義垂紳正笏不動聲色 而措國家於泰山之安至談李朝賢相者未嘗不以公爲先焉 聖世賢相昇平之時國有蓍龜民有父母學者有師斯文 有傳鄕有善俗世有良村其功施之普化行之美盖不可數計 而周知公之去也幼子無所仰庇朝廷無所稽疑斯文化爲異端 君子無與爲善小人沛然自得嗟夫公之存亡關於一世之治亂矣 昔公請老而歸于此以爲讀書養德之所而杖屨攸曁江草含香山 木生光斯亭屢廢屢興先有許公眉叟之記後有尹喜求先生之記 俱可誦而今不可見今其後孫會誠合力重建遺址高亭像舊制 而新之於是乎潛德發而幽光闡士林相慶曰先生遺躅斯可以復見矣 斯道益明則斯亭之棟樑階砌當與山水俱長也 一九六七年 六月 日 坡州郡守 南相集 謹記한자 鶩 : 집오리 목, 邃 : 깊을 수, 厖 : 클 방, 蓍龜(시귀 : 점을 치는 복서), 杖屨攸曁(장구유기 : 지팡이,신발, 바, 및), 階砌(계체 : 계단과 섬돌) 반구정 중수기(번역문) 옛날 파주군 서쪽 십오리 쯤되는 임진강 하류에 있는 마을은 사목리이고 길을 빙 둘러 들어가면 우뚝 솟은 봉우리 위에 새로 지은 정자가 강을 내려다 보게 된 것은 반구정인데 여기는 바로 翼成黃公 방촌선생께서 退遊하던 곳이었다. 대개 공은 깊은 식견과 탁월한 器局으로 국가에 대해 始終이 한결같았다. 대사를 결정하고 대의를 판단할 때 띠를 드리우고 笏을 바로 잡은 후, 聲音과 辭色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도 온 국가를 태산과 반석처럼 굳게 다져 놓았었다.이러므로 지금까지 조선의 현상을 따질 때면 반드시 공을 우두 머리로 삼는다. 착한 임금과 어진 재상이 태평시대를 이룩하게 되자, 국가에는 시귀(蓍龜)처럼 여기고 백성은 부모처럼 여겼다. 학자는 스승이 있게 되고 斯文은 전통이 있게 되었으며 시골에는 아름다운 풍속이 행해지고 세상에는 어진 인재가 다 뽑히게 되어 널리 베풀어진 정치와 교화가 한없이 훌륭했는데 낱낱이 다 열거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이 돌아간 후에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는 이가 없고 조정에도 의심스러운 일을 물을 데가 없었다. 사문이 異端으로 변하여 군자는 손잡을 사람이 없고 소인들만 제대로 시대를 잘 만난듯이 여겼다. 아! 이로 본다면 공의 존망은 한 시대 治亂에 관계가 컸었다. 옛날 공이 벼슬을 그만두고 이곳에 돌라와 반구정을 이룩하여 독서하고 養德하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장구(杖屨)가 미친 바에는 강풀과 산숲도 모두 향기롭게 빛났었다. 이 정자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은 許公 眉叟(미수)의 기문과 尹喜求선생의 후기가 모두 외울만 한데 지금은 정자가 없어졌다. 그래서 모든 후손이 성력을 모아 옛 터에다 정자를 다시 지었는데 옛날 제도에 따라 더 일신하게 하였다. 선생의 숨겨진 덕과 깊은 경지가 다시 나타나자 士林들이 서로 경사로 여기면서 "선생의 유족을 여기에서 다시 볼 수 있겠다. 이 올바른 도가 더욱 밝혀진다면 이 정자의 동량과 계체(階砌)도 마땅히 저 산수와 함께 길이 보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967년 6월 일 파주군수 남상집 삼가 지음동상 좌대에는 황희선생이 1423년(세종 5) 감사 재직시 남긴 유묵이 음각되어 있다
觀風樓(관풍루) 軒高能却暑-헌고능각서-(집이 높으니 능히 더위를 물리치고) 簷豁易爲風-첨활이위풍-(처마가 넓으니 바람이 통하기 쉽네) 老樹陰垂地-노수음수지-(큰나무는 땅에 그늘을 만들고) 遙岑翠掃空-요잠취소공-(먼 산 봉우리는 푸르게 하늘을 쓰는 것 같네)
글과 사진 2014년 10월 16일 권진순
'박물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선 청화(朝鮮 靑畫), 푸른빛에 물들다, 기획전-1 (0) | 2014.10.22 |
|---|---|
| 백자청화십장생어문탕지반 (0) | 2014.10.21 |
| 아미타 삼존 (0) | 2014.10.15 |
| 언문자 금속활자 (0) | 2014.10.09 |
| 백자청화 풀꽃무늬 사각함 (0) | 201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