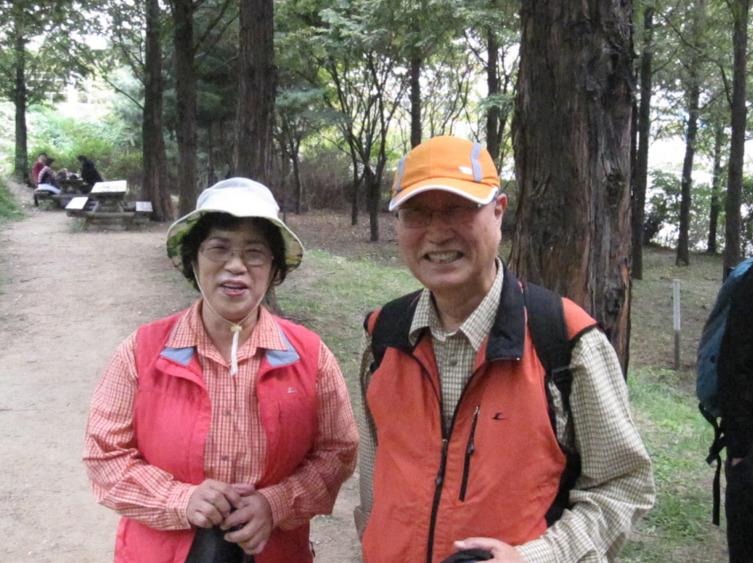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조선 청화(靑畫), 푸른빛에 물들다" 기획전을
2014년 9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려말 신흥 무인세력과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이 개창한 조선은 개국 초부터 문물과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도자기산업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땅에서 나지 않는 금.은기를 대신하여 도자기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위정자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도자기의 사용을 왕실에서부터 솔선수범하였으며, 특히 세종(1418~1450 재위)은 스스로 백자를 사용하며 이를 장려하였다.
또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도자기 제작지를 조사하였으며, 324개소에 이르는 제작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납(貢納)체계를 정비하였다. 도자기 제작소의 증가는 앞 시대에 제작된 고려청자가 왕실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에 비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도자기의 수요층이 보다 더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백자는 중국 원.명의 백자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제작되었는데 지금과 같은 단단한 백자가이때부터 만들어졌다. 백자의 완성과 더불어 청화기법으로 장식한 백자도 함께 전래되었다.
청화기법이란 백자 태토 위에 코발트가 함유된 안료인 회청(回靑)을 이용하여 문양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그 위에 유약을 입혀 고온에서 환원(還元) 번조(燔造)한 것을 청화백자라고 한다.
이 기법은 붓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문양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청화백자는 중국 원대(1271~1368) 징더전요(景德鎭窯)에서 완성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베트남과 조선, 일본에 전래되어 각각 그 나라 고유의 미감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코발트 안료는 멀리 페르시아 지방에서 생산되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 온 까닭에 매우 값비싼 재료였다. 오직 왕과 왕실의 전유물이었다. 근검과 절약을 통하여 성리학적 이상세계를
추구하던 조선의 지배계층은 왕명으로 청화백자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백자 항아리(白磁壺), 조선 15~16세기, 25.0cm
백자 항아리(白磁壺), 조선 15~16세기, 25.0cm
 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白磁 靑畫 梅鳥竹文壺),
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白磁 靑畫 梅鳥竹文壺), 조선15~16세기, 높이 16.5cm, 국보 제170호

 '地'가 새겨진 대접. 병. 항아리,
'地'가 새겨진 대접. 병. 항아리, '玄'이 새겨진 접시. 전접시(白磁地銘 大楪.甁.壺.玄銘楪匙.搌楪楪)
조선15~16세기
 매화 대나무무늬 항아리 조각(白磁 靑畫 梅竹文 壺片),
매화 대나무무늬 항아리 조각(白磁 靑畫 梅竹文 壺片), 조선15세기, 남은 길이 30.0cm
 왕실의 그릇과 음식을 관장하던 사옹원(司甕院)의 분원인 경기도 광주 분원리,
금사리, 도마리, 번천리, 송정동, 우산리, 선동리 관요 분포도.
경국대전,吏典에는 사옹원 수장인 都提調(정3품)1명,제조4,부제조5 등 관리와 沙器匠 38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매년 사옹원관리가 1급 화원들을 거느리고 광주의
관요(官窯)에 와서 백자위에 그림을 그렸다고 기록에 보인다.
왕실의 그릇과 음식을 관장하던 사옹원(司甕院)의 분원인 경기도 광주 분원리,
금사리, 도마리, 번천리, 송정동, 우산리, 선동리 관요 분포도.
경국대전,吏典에는 사옹원 수장인 都提調(정3품)1명,제조4,부제조5 등 관리와 沙器匠 38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매년 사옹원관리가 1급 화원들을 거느리고 광주의
관요(官窯)에 와서 백자위에 그림을 그렸다고 기록에 보인다.

 구름 용무늬 항아리(白磁 청화 雲龍文 壺), 조선17세기, 높이 24.5cm
구름 용무늬 항아리(白磁 청화 雲龍文 壺), 조선17세기, 높이 24.5cm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조선1474년편찬, 21.9cm x 17.9cm(각), 국립중앙도서관소장
오례는 국가의 각종 제사인 吉禮, 국가의 왕실의 경사와 관련된 嘉禮,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賓禮,
임금의 활쏘기, 군대사열과 같은 軍禮, 왕실의 상장과 관련된 凶禮의 다섯가지이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조선1474년편찬, 21.9cm x 17.9cm(각), 국립중앙도서관소장
오례는 국가의 각종 제사인 吉禮, 국가의 왕실의 경사와 관련된 嘉禮,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賓禮,
임금의 활쏘기, 군대사열과 같은 軍禮, 왕실의 상장과 관련된 凶禮의 다섯가지이다.







 구름 용무늬 항아리(白磁 청화 雲龍文 壺), 조선18세기, 높이 54.5cm, 박병래 기증
구름 용무늬 항아리(白磁 청화 雲龍文 壺), 조선18세기, 높이 54.5cm, 박병래 기증
 구름 용무늬 항아리(白磁 청화 雲龍文 壺), 조선18세기, 높이 52.4cm
구름 용무늬 항아리(白磁 청화 雲龍文 壺), 조선18세기, 높이 52.4cm
 흥녕부대부인 묘지(백자 청화 興寧府大夫人 墓誌), 조선1456년, 가로 27.1x세로 37.8cmx두께 1.2cm,
보물 제1768호, 고려대박물관 소장
묘지는 죽은 사람의 생년월일, 행적, 무덤의 坐向 등을 적어 무덤안에 묻는 것으로 자기 외에
판석등으로 만들어진다. 이 묘지는 청화백자의 가장 이른 편년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묘지의 주인공인 인천 이씨는 세조의 장모이며 貞熹王后(1418~1483)의 어머니인 흥녕부대부인이다.
'景泰7년 병자년인 1456년 7월14일에 대부인이 졸하여 10월 8일에 예를 갖춰 매장하였다'는
장례 경위와 생전의 덕행, 가계 및 후손들의 현황 등을 기록하였다.
흥녕부대부인 묘지(백자 청화 興寧府大夫人 墓誌), 조선1456년, 가로 27.1x세로 37.8cmx두께 1.2cm,
보물 제1768호, 고려대박물관 소장
묘지는 죽은 사람의 생년월일, 행적, 무덤의 坐向 등을 적어 무덤안에 묻는 것으로 자기 외에
판석등으로 만들어진다. 이 묘지는 청화백자의 가장 이른 편년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묘지의 주인공인 인천 이씨는 세조의 장모이며 貞熹王后(1418~1483)의 어머니인 흥녕부대부인이다.
'景泰7년 병자년인 1456년 7월14일에 대부인이 졸하여 10월 8일에 예를 갖춰 매장하였다'는
장례 경위와 생전의 덕행, 가계 및 후손들의 현황 등을 기록하였다.
 황수신 묘지(백자 청화 黃守身 묘지), 조선1467년, 가로28.6x세로38.9x두께1.8cm, 경기도박물관 소장
成化3년(1467)에 죽은 황수신(1407~1467)의 묘지로 묘지문을 지은이는 姜希孟(1424~1483)이다.
황수신은 黃喜의 아들이며, 세조의 집권에 중요한 역활을 한 인물이다.청화백자중 두번째로 오래됐다.
황수신 묘지(백자 청화 黃守身 묘지), 조선1467년, 가로28.6x세로38.9x두께1.8cm, 경기도박물관 소장
成化3년(1467)에 죽은 황수신(1407~1467)의 묘지로 묘지문을 지은이는 姜希孟(1424~1483)이다.
황수신은 黃喜의 아들이며, 세조의 집권에 중요한 역활을 한 인물이다.청화백자중 두번째로 오래됐다.
 김수항 묘지(백자 청화 金壽恒 묘지), 조선1699년, 가로13.5x세로21.0x두께1.2~1.5cm, 부산박물관 소장
이 묘지는 1689년에 세상을 떠난 김수항의 것으로 모두 9매이다. 제7매까지는 김수항에 관한 내용으로
송시열이 찬술하였으며, 제8매와 9매는 부인 나씨에 대한 것으로 장남 金昌集(1648~1722)이 찬술하였다.
제9매의 끝에는 '숭정기원 72년(1699년)6월 일번조로 적혀 있어 金昌協(1651~1708)의 문집인 農巖集의
기술과 일치한다.
김수항은 어떤 학자일까?
金壽恒(1629 인조7~1689 숙종15)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자는 久之,호는 文谷,조부는
淸陰 金尙憲이고 부는 동지중추부사 金光燦이다.1651년(효종2) 알성 문과에 장원하여 전적이 되었다.
1653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육조판서를 두루 거친후 1672년 44세의 나이로
우의정 1674년 갑인예송에서 형 金壽興이 영의정에서 물러나자 대신 좌의정에 1678년 종실 복창군.
복선군 형제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영암,철원으로 이배됨,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영중추부사,
영의정으로 8년간 있다가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진도에 위리안치후 사사됨
김상헌의 손자로 家學을 계승하고 宋時烈,宋浚吉과 교유했으며 시문에 능하고,특히 변려문에
능통했다 그러나 송시열과 尹拯사이의 사사로운 일(懷尼是非)을 임금에게 아뢰어 조정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로인해 마침내 사림을 분열시켜 놓았다고 비난받기도 하였다.
참고로 청음 김상헌의 시 한수(병자호란이후)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文谷 김수항은 육형제 자식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이며
그 동생 김창협,창흡,창업,창즙,창립 여섯아들은 모두 詩,書,畵에
능하였고 막내 창립만 요절했다. 안동 김씨세력의 뿌리라고 하여 외면당해 왔었다.
김수항 묘지(백자 청화 金壽恒 묘지), 조선1699년, 가로13.5x세로21.0x두께1.2~1.5cm, 부산박물관 소장
이 묘지는 1689년에 세상을 떠난 김수항의 것으로 모두 9매이다. 제7매까지는 김수항에 관한 내용으로
송시열이 찬술하였으며, 제8매와 9매는 부인 나씨에 대한 것으로 장남 金昌集(1648~1722)이 찬술하였다.
제9매의 끝에는 '숭정기원 72년(1699년)6월 일번조로 적혀 있어 金昌協(1651~1708)의 문집인 農巖集의
기술과 일치한다.
김수항은 어떤 학자일까?
金壽恒(1629 인조7~1689 숙종15)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자는 久之,호는 文谷,조부는
淸陰 金尙憲이고 부는 동지중추부사 金光燦이다.1651년(효종2) 알성 문과에 장원하여 전적이 되었다.
1653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육조판서를 두루 거친후 1672년 44세의 나이로
우의정 1674년 갑인예송에서 형 金壽興이 영의정에서 물러나자 대신 좌의정에 1678년 종실 복창군.
복선군 형제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영암,철원으로 이배됨,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영중추부사,
영의정으로 8년간 있다가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진도에 위리안치후 사사됨
김상헌의 손자로 家學을 계승하고 宋時烈,宋浚吉과 교유했으며 시문에 능하고,특히 변려문에
능통했다 그러나 송시열과 尹拯사이의 사사로운 일(懷尼是非)을 임금에게 아뢰어 조정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로인해 마침내 사림을 분열시켜 놓았다고 비난받기도 하였다.
참고로 청음 김상헌의 시 한수(병자호란이후)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文谷 김수항은 육형제 자식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이며
그 동생 김창협,창흡,창업,창즙,창립 여섯아들은 모두 詩,書,畵에
능하였고 막내 창립만 요절했다. 안동 김씨세력의 뿌리라고 하여 외면당해 왔었다.
 조선시대의 제기는 "祭器圖說"에 부합되는 종류의 제기도 있지만 일상용기를 활용한 제기도 있다.
'제'가 쓰여진 다각 발인 시접(시접)은 "제기도설"에서 제사 때 숟가락인 시(시)와 젓가락인
저(저)를 올려놓는 그릇이다. 일상용기를 활용한 도자제기는 간결하면서도 엄정한 형태로,
위는 넓적하면서도 오목하게 만들되 높은 굽다리를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은 팔각으로 모깎기하여 접시의 굽다리에 보이는 제기의 요소를 더하고 네면에
'祭','玄','酒','甁'의 네 글자를 넣었다.
조선시대의 제기는 "祭器圖說"에 부합되는 종류의 제기도 있지만 일상용기를 활용한 제기도 있다.
'제'가 쓰여진 다각 발인 시접(시접)은 "제기도설"에서 제사 때 숟가락인 시(시)와 젓가락인
저(저)를 올려놓는 그릇이다. 일상용기를 활용한 도자제기는 간결하면서도 엄정한 형태로,
위는 넓적하면서도 오목하게 만들되 높은 굽다리를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은 팔각으로 모깎기하여 접시의 굽다리에 보이는 제기의 요소를 더하고 네면에
'祭','玄','酒','甁'의 네 글자를 넣었다.
 '제(祭)'가 쓰여진 접시(백자 청화 祭銘 접시), 조선18~19세기
'제(祭)'가 쓰여진 접시(백자 청화 祭銘 접시), 조선18~19세기
 '제현주병(祭玄酒甁)'이 쓰여진 팔각으로 모깎기한 병(백자 청화 제현주병명 角甁), 조선18세기
'제현주병(祭玄酒甁)'이 쓰여진 팔각으로 모깎기한 병(백자 청화 제현주병명 角甁), 조선18세기
 구름 용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雲龍文 壺), 조선 18세기, 높이 42.8cm
구름 용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雲龍文 壺), 조선 18세기, 높이 42.8cm
 구름 용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운용문 호), 조선18세기, 높이 41.5cm
구름 용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운용문 호), 조선18세기, 높이 41.5cm


 한.중.일 청화백자의 교류
조선왕실의 청화백자는 禮와 함께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조선초기 청화백자는 중국 명대 청화백자의 영향을 받아 용이나 보상화 등
유사한 문양 표현을 발견할 수 있으나, 오래지 않아 조선만의 특징을 갖추개 되었다.
임진왜란이후 청화백자를 제작하게 된 일본 역시 특유의 청화백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일본의 화려한 이마리(伊萬里)자기가 조선후기 왕실의 명기(明器)에
포함되어 주목된다.
한.중.일 청화백자의 교류
조선왕실의 청화백자는 禮와 함께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조선초기 청화백자는 중국 명대 청화백자의 영향을 받아 용이나 보상화 등
유사한 문양 표현을 발견할 수 있으나, 오래지 않아 조선만의 특징을 갖추개 되었다.
임진왜란이후 청화백자를 제작하게 된 일본 역시 특유의 청화백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일본의 화려한 이마리(伊萬里)자기가 조선후기 왕실의 명기(明器)에
포함되어 주목된다.
 매화 대나무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梅竹文 壺), 조선15~16세기, 높이 36.4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매화 대나무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梅竹文 壺), 조선15~16세기, 높이 36.4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풀꽃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草花文 角壺), 조선18세기, 높이 23.0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풀꽃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草花文 角壺), 조선18세기, 높이 23.0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보상화 넝쿨무늬 접시(백자 청화 寶相華唐草文 접시), 조선15세기, 입지름 22.7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보상화 넝쿨무늬 접시(백자 청화 寶相華唐草文 접시), 조선15세기, 입지름 22.7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홍치이년'이 쓰여진 소나무 대나무무늬 항아리(白磁 청화 松竹文 弘治二年銘 壺)
조선1489년, 높이 48.7cm,국보 제176호, 동국대박물관 소장
'홍치이년'이 쓰여진 소나무 대나무무늬 항아리(白磁 청화 松竹文 弘治二年銘 壺)
조선1489년, 높이 48.7cm,국보 제176호, 동국대박물관 소장
 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梅竹鳥文 壺), 조선15~16세기, 높이 25.0cm
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梅竹鳥文 壺), 조선15~16세기, 높이 25.0cm
 매화 대나무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梅竹文 壺), 조선 15~16세기, 국보 제222호, 호림박물관 소장
매화 대나무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梅竹文 壺), 조선 15~16세기, 국보 제222호, 호림박물관 소장


 이상으로 기획전-1편,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를 마침니다.
이어서 기획전-2편을 준비되는대로 작성하겠습니다.
사진은 본인이 찍고 글은 '조선 청화' 도록을 참조하였습니다.
작성자 권진순
2014년 10월4일
이상으로 기획전-1편,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를 마침니다.
이어서 기획전-2편을 준비되는대로 작성하겠습니다.
사진은 본인이 찍고 글은 '조선 청화' 도록을 참조하였습니다.
작성자 권진순
2014년 10월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