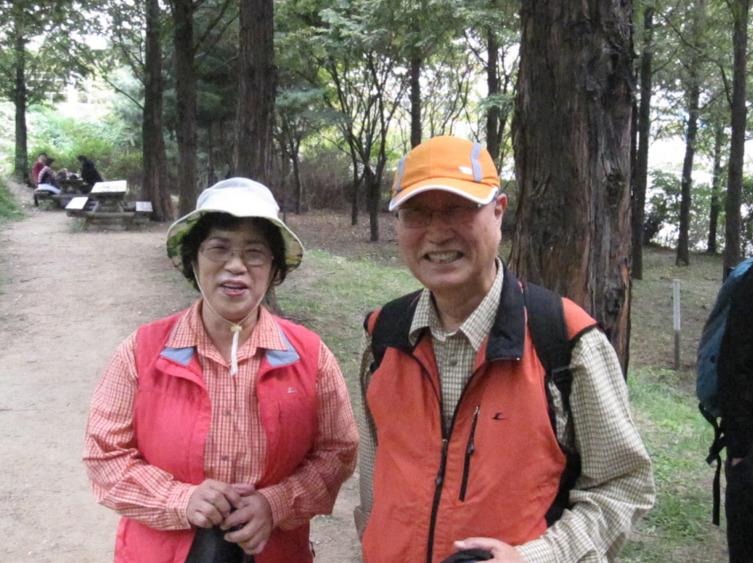우리궁궐지킴이
조선 청화(朝鮮 靑畫), 푸른빛에 물들다, 기획전-3 본문
조선 청화(朝鮮 靑畫), 푸른빛에 물들다, 기획전-3
문인이 사랑한 청화백자는 그림과 시들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 사군자 계열의 秋草文과 산수와 인물 등 조선 후기 지식층의 서화 골동, 분재 취미가 청화백자에 반영되어, 매화와 파초를 비롯해 문인 지식층이 즐겨 키우고 감상했던 분재와 괴석 화초들이 청화백자에 가득 찼다. 조선 전기에는 코발트 안료의 가격이 매우 비쌌던 데 비해 후기에는 중국 연경의 시장으로부터 값싼 무명청이(無名靑異)안료가 대량으로 수입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청화백자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제 그릇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생산량도 늘어나 청화백자가 마치 만민의 꿈과 바램이 온천하를 뒤덮듯 특히 장수와 복을 희구하는 마음이 직접적으로 청화 문양으로 표현되어 명실공히 "청화백자가 萬民의 그릇이 되었다". 조선 후기 청화백자에 그려진 민화의 소재들은 십장생, 용, 봉황, 호랑이 그리고 박쥐, 석류, 복숭아, 물고기와 게[魚蟹]등이다. 十長生은 해.산.바위.물.구름.학.사슴.거북.불로초[靈芝].소나무 등을 꼽는다. 용 봉황 거북 신선무늬 항아리에는 두 겹의 능화창(菱花窓) 안에 용 봉황 거북 신선무늬를 묘사하였고 그 사이 圓 안에는 '福','祿','壽'의 글씨가 쓰여 있다."매梅는 강산의 정신에 태고의 면목(江山精神,太古面木)" "국菊은 혼연한 원기에 무한한 조화(渾然元氣,無限造化)" "연蓮은 얼음 병의 가을 물, 갠 달빛에 빛나는 바람(氷壺秋水,霽月光風)" "모란牡丹은 부귀와 번화, 공론이 이미 정해졌다(富貴繁華,公論已定)" "석류石榴는 조비연과 양귀비가 총애로 육궁을 기울게 했네(飛燕玉眞,寵傾六宮)" "석죽石竹은 칭얼대지않는 아이(不哭孩兒)" -유박(柳璞,1730~1787), [花菴隨錄],[花品評論]중
1,2<인물무늬 병 白磁 靑畵 人物文 甁>은 파초와 목마를 즐기는 野服의 處士와 단칸 움막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관복 입은 벼슬아치가 초야에서는 유유자적하고 출사해서는 청빈낙도함을 미덕으로 여겼던 문인의 가치관을 시각화한 것이고, 우측의 <성새산수무늬 병 白磁 靑畵 城塞山水文 甁>은 청화백자의 산수문 중에서도 성새(城塞)라는 독특한 도상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의 성읍과 거주지를 묘사한 것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乙卯園幸(정조 19년, 1795)때의 <西將臺野操圖>의 도상과도 유사한 점이 있어서 흥미롭다.
괴석 꽃무늬 합(白磁 靑畵 怪石花文 盒), 조선19세기, 높이15.0cm, 입지름14.4cm
괴석 꽃무늬 사각 병(白磁 靑畵 怪石花文 四角 甁), 조선19세기, 높이19.5cm, 서산 마도리 발견
모란무늬 병(白磁 靑畵 牡丹文四角 甁), 조선19세기, 높이19.4cm, 서울역사박물관


괴석 꽃무늬 발(白磁 靑畵 怪石花文 鉢), 조선19세기, 높이13.8cm,입지름22.0cm 이 시기 문인 지식층에게 사랑받았던 꽃들은 괴석이나 나비.벌과 결합하여 몸체의 여러 면에 문양의 세트를 이뤄 나타나는데, 한 그릇에 모란, 매화, 국화, 패랭이꽃, 연꽃 등이 전부 혹은 일부 결합하는 예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크기가 작은 합이나 병, 잔 등에 한가득 나타나 마치 방 안에 있는 작은 꽃밭을 보는 듯하다.
윤회매 백매(輪廻梅 白梅), 茶愔, 2014

포도무늬 화분받침대(白磁 靑畵 鐵彩透刻 葡萄文 花盆臺), 조선18세기, 높이42.4cm, 지름24.2cm
"옛사람 중에는 파초를 벗한 이가 없는데, 나는 유독 파초를 사랑하지요. 줄기는 비록 백 겹으로 돌돌 말려 있지만 가운데가 본래 텅 비어 한번 잎을 펼치면 아무런 꾸밈이 없으니, 이 때문에 나의 마음을 터놓는 벗이 된 것이라오. 달 밝은 창이나 눈 내리는 창가에서 가슴을 터놓고 마음껏 이야기하니, 중산군이 민첩하여 말없이 도망치는 것과는 같지않소이다." *중산군 : 중산에서 나는 토끼의 털로 만든 붓 -연암 박지원(朴趾源,1737~1805)이 이서구(李書九,1754~1825)의 편지를 받고

1,2,3,기명절지무늬 탕기(白磁 靑畵 器皿折枝文 湯器), 4.기명절지무늬 발(鉢)



1.구름 봉황무늬 접시(백자 청화 雲鳳文 접시), 조선19세기, 높이5.5cm, 입지름19.7cm 2.용 봉황무늬 합(백자 청화 龍鳳文 합), 조선19세기, 높이12.9cm 3.구름 용무늬 접시(백자 청화 雲龍文 접시), 조선19세기, 높이2.5cm, 입지름18.5cm
구름 봉황무늬 접시(백자 청화 운봉문 四角 접시), 조선19세기, 높이2.8cm, 길이15.5cm
구름 용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운룡문 호), 조선19세기, 높이52.5cm,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복숭아무늬 접시,항아리.
모란무늬 접시,병
(우측) 꽃 새무늬 항아리(白磁 靑畵 花鳥文 壺), 조선18세기, 높이35.8cm 항아리의 불룩 튀어나온 어깨부분에 모란 넝쿨을 빙 돌려 배치하고 그 위에 새 두 마리가 마주 앉도록 하였다. 몸체 아랫부분에는 '家''和''萬''事''盛'의 다섯 글자를 원 안에 넣어 마찬가지로 빙 돌려 배치하였다. 가족의 화합을 새와 모란의 결합으로 표현한 18세기 청화백자의 문양으로서는 吉祥을 나타내는 흔치 않은 예이다. (좌측) 꽃 새무리 항아리(白磁 靑畵 花鳥文 壺), 조선18세기, 높이36.1cm 문자 없이 넝쿨과 새의 결합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박쥐무늬 대접(白磁 靑畵 蝙蝠文 大楪), 조선19세기 길상 무늬 중에서도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박쥐무늬이다. 박쥐를 뜻하는 '蝠복'자가 '福'의 중국어 발음과 같은 까닭이다.
(좌)거북이 구름무늬 접시(白磁 靑畵 龜雲文 楪匙) (우)산수 거북이무늬 접시(白磁 靑畵 山水龜文 楪匙), 조선19세기 거북이는 '壽'를 상징하며 오래 산다는 長壽의 뜻
산수 물고기무늬 접시(白磁 靑畵 山水魚文 楪匙), 조선19세기 일명 魚變成龍圖, 登龍門圖라 불리우며 '祿'을 상징한다. 중국 황하 하류에서 360마리 잉어가 강물을 거슬러 산서성 허진(河津)에 있는 용문을 향해 올라간다.용문에 이르러 새끼를 낳아 3,600여마리가 되는데 물결이 험하여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용감한 한 마리만이 용문을 통과할 수 있느데,용문을 통과한 잉어는 몸의 아래쪽에 있는 36장의 비늘이 거꾸로 돋고 몸을 흔들면서 용으로 변하는데 그 비늘에 한번 닿기만 하면 어떤 물건이라도 부서져버린다.
파도 물고기무늬 병(白磁 靑畵 波魚文 甁), 조선19세기, 높이30.9cm 바다 물결 속의 물고기.새우.조개.게 등을 그린 것은 물고기는 多産을, 바다새우는 '海老'라하여 '偕老'즉, 부부가 오래 같이 산다는 의미이고, 새우를 뜻하는 '蝦'는 '賀'와 음이 같아 축하를, 조개'蛤'은 '合'과 음이 같아 화합을 의미한다. 잉어,쏘가리.메기는 출세를, 게는 갑옷 모양의 '甲'으로 장원급제를 뜻하기도 한다.


'운현'이 쓰여진 영지 넝쿨무늬 병(白磁 靑畵 靈芝唐草文 雲峴銘 甁), 조선19세기, 높이31.3cm 이 그릇은 1864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이 곧고 길며 몸체가 둔중한 병에는 전면에 영지(靈芝)넝쿨무늬가 가득 채워졌는데 굽바닥에 청화 세필로 '雲峴'의 명문이 있다. 유색과 청화의 발색도 좋지만 입구 부분과 몸체 밑부분에 돌린 여의두와 연판문대까지 정성스럽게 묘사하고 청채(靑彩-청화 안료를 몸체 전체에 씌운 기법)를 가했다.
'운현'이 쓰여진 명지 넝쿨무늬 항아리(백자 청화 영지당초문 운현명 壺), 조선19세기, 높이19.4cm 영지 넝쿨무늬 병과 유사한 문향을 가진 항아리 한 쌍 역시 굽바닥에 '운현'의 명문이 있다.

[비변사등록] 제231책 헌종 10년(1844) 2월 "司啓曰...內資寺盤沙器契貢人等以爲 丁酉嘉禮時 依公文進排盤 爲千餘竹 沙器爲萬餘竹... -사司에서 아뢰기를, ...내자시 반사기계 공인 등은 정유년 가례시 공문의 의거하여 진배한 반이 천여 죽, 사기가 만여 죽이라 하나 ..."




모란무늬 발(白磁 靑畵 牡丹文 鉢), 조선1847년경/1852년경, 높이27.0cm, 입지름37.4cm
"우리 한국의 하늘은 지독히 푸릅니다. 하늘 뿐이 아니라 동해바다 또한 푸르고 맑아서 흰 수건을 적시면 푸른 물이 들 것 같은 그런 바다입니다. 나도 이번 니스에 와서 지중해를 보고 어제는 배도 타봤습니다만 우리 동해바다처럼 그렇게 푸르고 맑지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결을 좋아합니다. 깨끗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에 사는 우리들은 푸른 자기 청자를 만들었고...아름다운 백자를 만들었습니다." 김환기
청화백자의 안료 산화코발트와 파란색 안료들(Cobalt Blue and the Other Pigments) 파란색을 내는 안료로는 남동광(Azurite), 청금석(Ultra marine, 산화코발트(Cobalt blue)가 있다. 청화백자의 안료인 산화코발트는 천연 광물 상태에서는 흑갈색이지만, 가마에서 높은 온도를 이겨내면서 신비스러운 청색이 된다. 산화코발트와 달리 남동광과 청금석은 고온을 겪게되면 색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무기 안료는 광물 상태에서 청색이 있는 부분만을 채취한 뒤 가루로 만들어, 벽화나 유채 그림, 궁궐 단청 등에 사용한다.
산화코발트 산화코발트는 페르시아가 원산지이며 청금석에 비해 저렴하다. 가마에서 높은 온도를 이겨내면서 신비스러운 푸른 빛이 된다. 고온의 소성 온도에서 잘 녹지 않으면서도 유약 안에서 청색이 고르게 퍼져나가면서 신비로운 색을 내는 무기 안료이다. 중국 도공들은 백자 태토 위에 산화코발트를 사용하여 채색(靑畵)한후 투명 유약을 입힌 화려한 청화백자를 만들었다. 조선 초기에는 청화백자를 전량 수입하고 순백자만 생산했으나 중국의 청화백자의 영향을 받아 푸른 청안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청화백자를 생산하게 되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꽃나무를 배경으로 삼는 수도 있고 하늘을 배경으로 삼을 수도 있다. 몸이 둥근 데다 굽이 아가리보다 좁기 때문에 놓여있는 것 같지가 않고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것 같다. 희고 맑은 살에 구름이 더가도 그늘이 지고 시시각각 태양의 농도에 따라 청백자 항아리는 미묘한 변화를 창조한다. 漆夜三更에도 뜰에 나서면 허연 항아리가 엄연하여 마음이 든든하고 더욱이 달밤일 때면 항아리가 흡수하는 月光으로 인해 온통 내 뜰에 달이 꽉 차 있는 것 같기도 하다." 1955년 5월 김환기 '조선 청화,푸른빛에 물들다' 중앙박물관 기획전-3 으로 모두 마침니다. 사진과 글 권진순 2014년 10월 6일
'박물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주 문화탐방(2014.11.03) (0) | 2014.11.05 |
|---|---|
| 나전경함 (0) | 2014.10.29 |
| 조선 청화(朝鮮 靑畫), 푸른빛에 물들다, 기획전-2 (0) | 2014.10.23 |
| 조선 청화(朝鮮 靑畫), 푸른빛에 물들다, 기획전-1 (0) | 2014.10.22 |
| 백자청화십장생어문탕지반 (0) | 201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