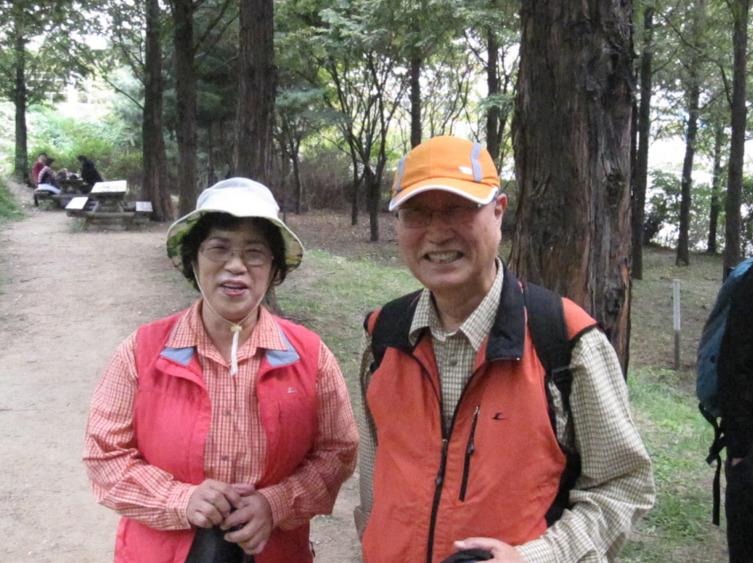우리궁궐지킴이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본문
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활용하여
우리말을 쓰고 읽었는데, 이것을 차자 표기법(借字 表記法)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지명이나 인명 등의 고유 명사를 적는 데 차자 표기를 사용했지만
이후에 이두, 향찰, 구결 등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어휘를 넘어 문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자 표기 방식은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는데,
특히 이두는 조선 후기까지 쓰였습니다.
이것은 한글이 새로운 문자로 창제되었어도
상당 기간 동안 차자 표기가 존속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고유명사 표기)
차자 표기(借字表記: 글자를 빌려 씀.)는
초기에 주로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 명사를 표기하는 데 사용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비[고구려]’에 새겨진 비문에서
그 예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비문에 신라와 백제의 국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명과 지명 표기가 나타납니다.
고유 명사의 차자 표기는 당시 고유어 발음과
가장 비슷한 음을 가진 한자를 빌려서 적은 것으로,
한자의 원래 뜻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자의 뜻을 무시하고 한자의 음만 빌려서 적는 것은
차자 표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두)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우리말의 어순대로 문장을 표기한 것입니다.
초기의 차자 표기가 단순히 고유 명사 표기에 머물렀던 반면
이두는 우리말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두 표기는 주로 행정용 문서를 비롯한
실용문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은 이두 표기의 대표적인 자료인데,
신라에 충성을 맹세하는 두 사람의 다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하늘 앞에서’를 뜻하는
‘天前’은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前天’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말 어순에 따라 ‘天前’으로 적었습니다.
(향찰)
(구결)
훈
'박물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립한글박물관 주말걷기 사전 답사 사진(핸드폰) (0) | 2014.12.05 |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고바우 (0) | 2014.12.05 |
| 국립한글박물관 (0) | 2014.12.04 |
| 일본식 머리를 한 여인 (0) | 2014.12.03 |
| 쾌청한 가을날 (0) | 2014.11.26 |